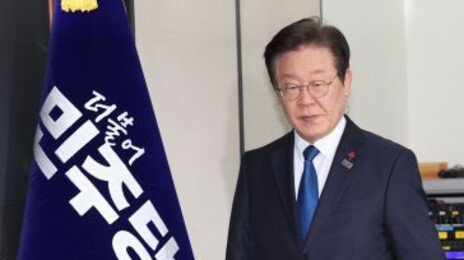“이 작품에 쏟은 시간이 모두 8년쯤 되요. 의대 졸업반이던 94년 여름방학, 의대 생활을 제대로 정리하고 싶어 작품의 전반부를 마무리했습니다. 후반부는 인턴 과정 중에 졸린 눈을 비비며 썼지요. 의사가 되는 것도 ‘대하소설’이고 글 쓰는 일도 ‘대하소설’과 마찬가지 잖아요. 알에서 깨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쾌감을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들은 여러 명 있지만, 문단에 등단까지 한 경우는 드물다. 정신과 의사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정신과를 찾는 환자의 고민들은 현실에서 겪는 인생의 갈등이 많지요. 개인사와 가족사부터 회사 학교 등 모든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진료와 글쓰는 일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해법을 찾을 때가 많거든요.”
작가가 되기까지 그를 글쓰기의 세계로 이끌어 준 사람은 초등학교 은사인 아동문학가 임신행씨. “초등학교 5학년 때, 다른 반 담임이었던 임선생님께서 교내 백일장에 제출한 글을 보고 교실로 찾아 오셨어요. 그 후로 졸업할 때까지 4절지에 빼곡이 글을 채운 다음에야 집에 돌아갔어요. 선생님께서는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겠다는 생각보다는 문단에서 정확한 평가를 받으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대학 입학을 계기로 그는 마치 의무감처럼 끊임없이 소설을 썼다. 습작기의 작품은 주로 현실의 고뇌, 앞날의 희망을 다룬 장편들. 그런데 첫 작품을 자신의 생활과 너무 밀착된 이야기를 다룬 것이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내 작품은 사실적으로 묘사한 ‘현실적 소설’입니다. 메디컬 드라마처럼 의대생을 미화하거나 단순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든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고, 의사 집단에서 보이기 싫은 부분도 드러내고요. 그러나 의사가 의사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누가 의사 아니랄까봐 “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이 ‘재미’와 함께, 살살 흩어낸 양념 속에서 소화제 정도의 ‘약’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빙긋 웃었다.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