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선은 간할수록 뻣뻣해진다
재앙을 만난 생의 몸부림
적멸의 행간은 왜 그리 먼가
여말에 요승이 임금 업고 까불 때
간 잘 맞춘 임박은 승지가 되고
간하던 내 선조 임향은 괘씸죄 쓰고
남포 앞 죽도로 귀양 가 소금이 됐다
세상에 간 맞추며 사는 일
세상에 스스로 간이 되는 일
한 입이 내는 奸과 諫 차이
한 몸 속 肝과 幹 사이는 그렇게 먼가
꼴뚜기는 곰삭으면 무너지지만
멸치는 무너져도 뼈는 남는다
꽁치 하나 굽는데도 필요한 소금
과하면 짜고 모자라면 싱거운
간이란 그 이름을 세워주는 毒이다
간이 맞아야 입맛이 도는
입맛이 돌아야 살맛 나는 세상에
그 어려운 소금 맛을 늬들이 알어?
-‘간’
‘간’이라는 우리말은 짠맛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짠맛을 내는 재료를 뜻한다. 그런데 국 한 그릇을 끓이든 말 한마디를 하든 그 간 맞추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싱겁고 짠 것도, 간계(奸計)와 간계(諫戒)의 차이도 한끝이 모자라거나 넘치는 데서 생겨난다. ‘세상에 간 맞추며 사는 일’도 어렵거니와 ‘세상에 스스로 간이 되는 일’은 더 험난하다. 이 시는 ‘그 어려운 소금 맛’의 지혜를 푸성귀와 생선, 꼴뚜기와 멸치, 그리고 임박과 임향이라는 인물을 비교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그런 묘미를 터득하고 있어서일까? 임영조 시인의 시는 잘 절여진 배춧잎처럼 간간하면서도 생기가 남아 있고, 간이 밴 고등어처럼 연륜이 느껴지면서도 무겁지 않다.
새로 나온 시집 ‘시인의 모자’(창작과비평사)에서도 사유와 언어의 탄력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간기가 조금 엷어진 느낌도 든다. 아마도 ‘시인의 말’에 밝힌 것처럼 ‘현란한 수사와 난해한 상징’을 버리고 ‘종교적 엄숙성이나 철학적 심각성, 화자의 우월적 사고나 교시 따위’를 스스로 경계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한 그릇의 담백한 국을 끓여내기 위해 시인은 얼마나 부단히 언어의 간을 맞추었을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시는 영원히 아슬아슬한 수공업일 수밖에 없다.
나희덕 시인·조선대 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세수 펑크 메운 ‘유리 지갑’… 되짚어야 할 ‘넓은 세원’ 원칙[광화문에서/박희창]](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58810.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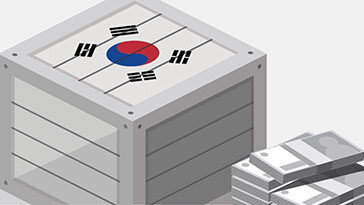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