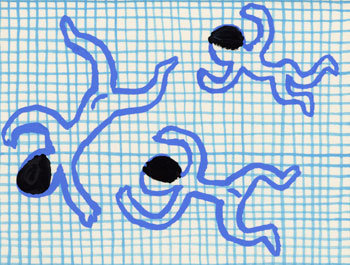
“김해에서 왔다고 하더라”
“그라믄, 타관 사람이가?”
“어차피 돈이 목적 아니겠나”
“돈도 돈이지만, 그 여자 미인이다 아이가?”
“미인 좋아하네, 서른 다섯이다. 너보다 일곱 살이나 많다 아이가, 아지매다 아지매”
“자슥까지 있는 아지매라도, 밥하고 빨래는 일하는 사람 시키고, 보석하고 비단으로 치장하고 동동 크림 바리고, 시세이도, 카네보 향수 뿌리고 아양을 떨면, 얼매든지 남자를 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이고, 우째 그 여자만 그래…”
“그란데, 그 여자 딸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손발이 불편타고 하던데”
“그거 안 됐네. 아직 네 살이나 그쯤 아니겠나”
“그란 일도 있어야 뭐가 좀 맞지”
“뭐가 좀 맞는데?”
“우리들하고 균형이 좀 맞는다 그 얘기다”
“자슥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전생에 죄가 많은 기다”
“안 그라면, 호로자슥 될 리가 없재”
솔솔 살랑살랑 솔솔 살랑살랑 바람이 여자들의 수다에 끼여들었지만 맞다고 맞장구를 쳤는지 아니라고 얘기를 끊었는지 알 수 없었다. 종실은 엉거주춤 허리를 들고 배다리 주변을 훑어보며 다리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 사이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았다. 자 간다! 앗! 차갑다! 양지바른 물가에서는 벌거벗은 아이들이 손발을 널빤지처럼 좍 펴고 일부러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물 속에서 튀어나왔다가 잠수를 하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물을 끼얹기도 하면서 까르륵까르륵 웃어대고 있다. 6월의 물은 아직 차갑다. 아이들은 온 몸에 닭살이 돋고 팔뚝의 솜털이 곤두선 정도 가지고는 물에서 나오지 않는다. 관자놀이가 아파 오고 입술이 시퍼렇게 변하면 반소매 저고리와 바지, 치마를 벗어놓은 삼각주로 올라와 찬물에 벌겋게 언 살을 햇살에 드러낸다. 종실은 강 건너에서 남편의 모습을 찾아내고는 발돋움을 하며 손을 휘휘 흔들었다. 하지만 남편은 나무틀에 시멘트를 처넣느라 알아차리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자갈을 주워 남편을 향해 던졌는데 물총새떼 속으로 떨어져, 물총새떼가 한꺼번에 날아올랐다.
“아이고, 어린애 같은 짓 좀 하지 말아라. 서방이 한눈 팔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우짤라고 그라노?”
글 유미리
8월의 저편 >
-

밑줄 긋기
구독
-

나민애의 시가 깃든 삶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소설]8월의저편 265…1933년 6월 8일(10)](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제 패스 받아서 골이 터지면 이강인 부럽지 않아요”[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061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