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사물들은 사이좋게 연관되지 않았다
나와 현실은 변화의 방식을 달리했다
빛은 늘 등 뒤에서 왔고
속도와 속도 사이로 길이 지나갔다
앞서 걷는 사람의 앞모습은
내가 알 수 없는 그림자였다
저, 완강한 배후
사물의 뒷모습을 보면
운명 같은 것이 느껴진다
더 멀리 보여
하나이었던 이름을 흩어놓는다
■‘길 위에서 묻는 길’(천년의 시작) 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직서를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개는 착잡한 마음으로 사직서를 쓰게 된다. 더 좋은 일터로 옮겨갈 운 좋은 사람도 막상 사직서를 쓰는 순간에는 활달하던 움직임도 둔해지고 손놀림도 더뎌질 것만 같다.
바로 그 순간, 자신이 떠나려는 곳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젊은 모습으로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역류할 것이기에. 이 시를 쓴 사람도 콧노래를 흥얼대며 사직서를 쓰지 못했다. 뒤를 돌아다봤을 때 사물들은 서로 사이좋게 연관되지 않았고 현실과 그는 변화의 방식을 달리했단다.
현실과 화합하거나 꿈의 방식을 달리 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방식을 달리했다는 그도, 이 시를 쓸 무렵엔 보들레르처럼 편안한 일상이 주는 권태를 죽음보다 더 무서워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상하게도 자신의 그림자가 늘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돌처럼 단단한 응어리가 느껴진다. 빛은 늘 등 뒤에서 왔다고 하는 이 시인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인간의 풍부하고 다양한 감정이 수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타인의 얼굴까지도 하나로 뭉뚱그려 어두운 그림자로 받아들인다. 서로 가식 없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는 진정한 소통도 화합도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말이다.
이 시는 차분하고 단정하게 짜여 있고 운율도 경쾌하지만, 왠지 마음이 답답해져 나는 얼른 시집에 실린 시인의 사진을 찾아본다.
사진 속의 그는 웃고 있다. 사진 밑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는 설명도 있다. 다행이다. 그가 이 시를 쓸 때의 의식적, 무의식적 심경에서 많이 벗어나 보여서. 날씨가 부쩍 더워졌다. 사직서를 써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울적하게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지금쯤 비장한 마음을 잠시 접고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같다. 나는 직장인들과 같은 강도의 노동력을 이 사회에 제공하지 못해 그 달콤함을 맛볼 수는 없지만, 조금씩 들뜨기 시작하는 그들의 휴가 계획에는 귀가 솔깃해진다.
조은 시인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토요일에 만나는 시]'성에꽃' 이원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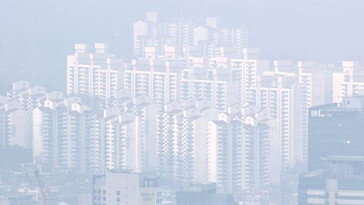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