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 파격적이고 대담한 구도와 극도로 절제된 간결한 형태는 때로 보는 이를 당혹스럽게 한다. 이 같은 그의 화풍은 오랫동안 그의 사유를 묶고 있는 초현실주의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람 없이(?) 폭풍이 부는 들판에 말이 달리고 느닷없이 탁구대가 등장하는 ‘바람 없는 폭풍’이나 코카콜라 자판기 옆에 서있는 나부(裸婦)의 뒤로 끝없이 펼쳐진 아스팔트를 그린 ‘국도’ 등은 현실에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물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초월과 비현실의 상상력을 자아내는 작품들이다.
그런 그가 이번 전시의 주제로 ‘합일’을 들고 나왔다. 작가는 “나이가 들고 자연에서 생활하다보니, 더 겸손해진 탓”이라고 말한다. 10년째 대구 근처 칠곡군에 살고 있는 그는 산책로에서 만나는 잎 떨어진 나뭇가지나 돌멩이, 잡초와 소통하며 인간과 자연의 합일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한적한 바닷가나 숲을 무대로 사람을 그려 넣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으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면의 주인공들이 예전처럼 자연과 분리된 객체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가 됐다.
마치 시간을 잊어버린 듯 나뭇가지와 뒤섞여 눈을 감고 누워있는 남자를 그린 ‘날짜가 없는 시간’을 보면 남자의 모습 그대로가 한 그루 나무처럼 보인다. ‘낯선 장소’는 원래 큰 나무기둥을 밀어내고 있는 남자의 옆모습을 그린 것인데 작가가 마지막에 아예 나무를 지웠다고 한다. 허공에 긴 팔을 내밀고 있는 모습에서 피할 수 없는 질곡에 묶인 인간의 내면이 느껴진다.
정병국은 “작가는 많아도 화가는 없고, 화가는 많아도 작품은 없다는 이 시대에 태고 적부터 영원한 장르인 회화에 매진해 인간의 혼과 정신을 표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최근까지 그린 17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18일까지 서울 관훈동 노화랑. 02-732-3558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전시 >
-

유레카 모멘트
구독
-

2030세상
구독
-

DBR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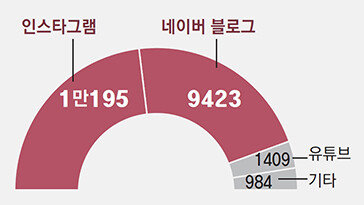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