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기 고려시대 말 과거급제자의 평균 연령은 21.5세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들어 양상은 바뀌기 시작했다. 태조에서 명종(1567년)까지 조선시대 전기의 과거급제자는 20대가 48.6%, 30대가 36.9%, 40대가 8.4%였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올수록 30대가 약진하기 시작했다. 선조에서 고종까지 과거급제자 1만976명 중 30대 4282명(39%), 20대 2849명(26%), 40대 2369명(21.6%) 순으로 바뀐 것이다. 관직은 한정되고 지원자는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때문이었다.
격동의 대한제국과 일제 치하에서 30대는 나라를 뒤흔들 꿈을 꾸었다.
1859년 35세가 된 최제우는 동학을 창시했다. 1884년 33세이던 김옥균은 20대인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등을 이끌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개화를 지향한 유길준은 20대에 미국과 일본을 둘러보고 30세에 ‘서유견문’을 썼다.
1919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민족대표 중 4명이 30대였고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각료 8명 중 외무총장 김규식은 38세였다. 1920년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은 당시 32세였다.
일제 치하에서 문인들을 발굴하고 키운 사람들도 30대였다. 1939년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의 ‘청록파’를 발굴한 정지용은 37세였다. 인촌 김성수는 30세에 동아일보를 창간했고 이광수는 34세 되던 해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맡았다. 김동인은 30세 되던 해 ‘젊은 그들’을 동아일보에 연재했다.
광복 후 30대의 약진은 군에서 두드러졌다.
한국군 ‘군번 1호’였던 이형근이 참모총장이 된 56년. 그의 나이는 36세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군 준장이 된 것 역시 36세 때였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그를 보좌했던 김종필은 35세, 박종규는 31세, 차지철은 27세였고 당시 참모총장 장도영도 38세에 불과했다.
한국 경제를 쥐고 흔들었던 사람들도 그 본격적인 시작은 모두 30대 안팎이었다.
이병철은 28세 되던 해 삼성그룹의 모체인 삼성상회를 열었고 정주영은 35세되던 1950년에 현대그룹의 모체인 현대건설을 창립했다. 김우중은 34세에 대우실업을 만들었다.
7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급격히 커지는 기업 조직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부족했다. 사회는 과감히 30대에게 자리를 만들어줬다. 이명박이 현대건설 사장에 오른 건 그가 36세 때였고 79년 율산그룹이 도산했을 때 신선호의 회장 나이는 32세였다.
그리고 90년대 가인(歌人)들은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을 때 ‘잔치는 끝나’고 30세가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21세기 30대가 서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커버스토리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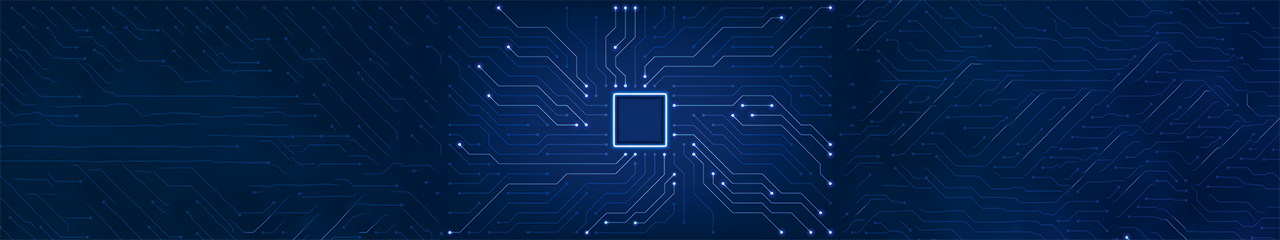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한규섭 칼럼
구독
-

정용관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