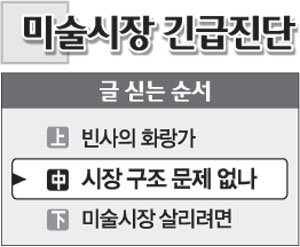
한 화랑 괸계자는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구매자가 작가 전속 화랑을 통해 작품을 사지 않는것”이라며 “인기작가 작품들을 심지어 큰 표구사 같은 데서도 거래하고 소위 나까마(중간상인)들이 나서서 덤핑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가들 까지 컬렉터와 직거래로 사게 팔고 있으니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직거래조차 몇몇 팔리는 작가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 문제. 대부분의 작가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는 요즘, 작업하기가 힘든 것은 물론 생계마저 걱정하는 극빈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심화돼 작가-화랑-컬렉터간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시장상황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격 기능의 실종은 장기적 안목보다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온 화랑-작가-컬렉터 모두에게 잘못이 있지만, 무엇보다 화상(畵商)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중견 화랑 대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90년대 초반까지 호황기를 보낸 화랑들이 작품을 파는 데만 급급해 컬렉터 관리나 투명한 유통구조를 도입하지 못한 채 외환위기를 맞았다”고 반성했다.

|
여기에 작가들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경기가 침체하면 스스로 작품가격을 낮춰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도 “가격을 내릴 바엔 안 팔겠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매매가와 호가 사이에 간극이 커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현재 미술시장은 ‘다중가격’ ‘무가격 시장’이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다.
컬렉터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소품-신진작가 작품-대가 작품 등 피라미드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외국 컬렉터들의 구입행태에 비해 한국에서는 오로지 대가의 작품에만 매달린다는 것이다.
미술품 경매회사인 서울옥션 김순응 대표는 “한국 컬렉터들은 미술품도 가격의 등락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장 미술품은 반드시 가격이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아해서 구입한 미술품이 나중에 가격이 올라 이득을 보면 그것을 덤으로 여기는 진정한 애호가들이 그립다”고 말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박중현 칼럼]‘개혁 주체’에서 ‘개혁의 적’으로 바뀐 尹의 운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67355.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