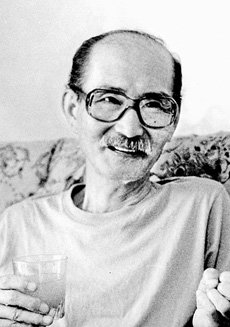
매일 오전 10시, 오후 7시 하루 두 차례 30분만 허용되는 면회시간. 기자가 병원을 찾았던 2일 오전, 매일 병원을 오가는 큰딸 영희씨(60)와 외손녀 보라씨(32)가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얼굴로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시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숨이 막히니 뇌로 가야 할 산소가 부족해 혼수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가녀렸던 육신은 더 졸아붙어 보인다. 어린아이처럼 가느다란 팔과 목에 두꺼운 링거 줄이, 콧구멍에는 산소호흡기가 매달려 있다. 양 눈에는 두터운 거즈가 덮여 있다. 안구 건조를 막기 위해서다.
시인의 육신은 병원이라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육신과 소통할 길은 없어 보인다. 문득 시인이 세상 밖에 있는 듯하다. 영희씨는 “쓰러지시기 얼마 전부터 부쩍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며 ‘내가 죽으면 너그 엄마가 마중 나올라나’ 하고 농을 하셨는데, 저리 눈을 감으시고 어머니라도 만나고 계신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한다.
머리맡에는 담당 간호사가 붙여 놓은 시인의 시 ‘꽃’이 있다. 분당 이웃으로 거의 매일 문병하는 시인 심언주씨가 붙여 놓은 ‘꽃을 위한 서시’도 있다.
딸과 손녀는 연방 시인의 부어오른 팔다리를 주무른다. 한 10여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환자의 손과 발이 부르르 떨린다. 하품을 하듯 입이 벌어지다가 다물어졌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인다. 두 사람이 “아버지” “할아버지” 불러 보지만, 시인은 대답이 없다. 다시 이어지는 가늘고 낮은 숨소리, 양옆에 세워 둔 맥박 혈압 체크 모니터만이 생명의 이어짐을 증거하고 있다.
시인의 주치의는 “초반에 체온이 올라가 걱정했는데 이제 맥박 혈압까지 모두 정상”이라며 “다만 합병증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병실에는 문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심언주씨는 “7월 말 뵈었을 때만 해도 당신이 기획하신 ‘류기봉 포도밭 작은 예술제’(지난달 29일)를 잔뜩 기대하고 계셨는데 결국 가시지 못했다”면서 “예술제 때 걸린 선생님의 시 ‘디딤돌, 처용’의 시구처럼 숲속에서 잠을 깨듯이 젊고 튼튼한 상수리나무가 되어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고 소원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