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멀리서는 그저 한 덩이로만 보이는 그들도 가까이 가서 보면 두 종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날카로운 병기와 채찍을 들고 일을 시키는 쪽으로, 패왕 항우를 따라 제(齊)나라를 치러 온 초(楚)나라 군사들이었다. 우두머리가 죽은 뒤에도 항복 않고 맞서는 반도(叛徒)들을 뒤쫓아 멀리 북해까지 왔다가 마침내 그들을 쳐부수고 서쪽으로 되돌아가는 중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초나라 군사들에게 짐승처럼 몰리며 일하고 있는 쪽으로, 죽은 제왕(齊王) 전영(田榮)의 군사들이었다. 전영이 죽자 멀리 임치까지 도망쳐 와 버텼으나 끝내 패왕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모진 고초와 학대를 받으면서 끌려가다가, 갑자기 그곳에 내몰려 벌써 이틀째 땅을 파고 있었다.
일을 시키는 초나라 군사들은 하나같이 독이 올라 있었다. 채찍을 날리고 창대를 몽둥이 삼아 휘두르면서 인정사정없이 제나라 항병(降兵)들을 몰아댔다.
“빨리 빨리 해. 이 버러지 같은 것들아!”
“어서 파라고. 이 썩어 자빠질 시체 같은 놈들아!”
“뭐? 제나라를 다시 세워? 죽은 전영의 원수를 갚는다고? 예라이, 순….”
그렇게 욕하면서 때리거나 차는 쪽은 차라리 점잖았다. 초나라 군사 태반은 일을 시키기 위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힐 구실을 찾기 위해 일을 다그치고 있는 듯했다. 그러다가 용케 죽일 만한 구실을 찾아내면 바로 창칼을 휘둘러 항병들의 목숨을 끊어 버리기도 했다.
“어이, 참아. 그런다고 저것들한테 죽은 고향 친구들이 되살아나나?”
“한둘 죽인다고 내일 당장 싸움 끝내고 부모처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손에 피만 묻히지, 구석구석 쥐새끼들처럼 몰려다니는 것들을 다 어쩔 거야?”
초나라 군사들 중에도 그렇게 좋은 말로 말리는 자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살벌한 분위기가 자아내는 공포는 대단했다. 이미 지난 며칠 공포에 길들여진 제나라 항병들은 이제 체념을 넘어 일종의 마비에 빠져들고 있었다. 무얼 하는지도 모르면서 당장 자기들을 노려보고 있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허둥지둥 땅을 팠다.
이윽고 황토 언덕 사이의 얕은 골짜기는 길고 깊은 구덩이로 변했다. 1000여명의 포로들이 이틀에 걸쳐 판, 길이 한 마장에 너비와 깊이가 모두 세 길이 넘는 황토 구덩이였다.
황토 언덕 위에서 일의 진척을 살피고 있던 군사 하나가 저만치 작은 진세를 이루고 있던 저희 편에게 깃발로 신호를 보냈다. 일을 시키던 군사들보다 한층 엄중하게 무장한 초나라 군사 한 떼가 미리 준비된 긴 사다리를 들고 언덕으로 달려왔다. 그들이 들고 온 사다리를 구덩이 바닥에 걸치며 소리쳤다.
“어이, 그만하면 됐어. 모두 올라와 목이라도 축이고 다시 해.”
그러자 구덩이 바닥에서 포로들을 몰아대던 초나라 군사들이 하나둘 사다리를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건강 기상청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부동산팀의 정책워치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四. 흙먼지 일으키며](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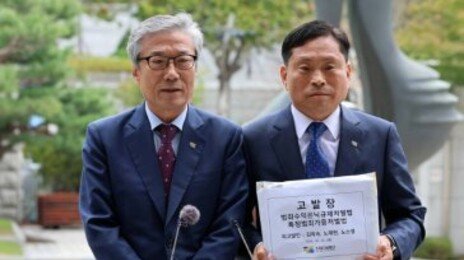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