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경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빙허 현진건의 ‘불국사기행’을 펴들었다. 빙허는 1929년 여름 불국사를 찾아 기행문을 동아일보에 기고했다.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이 글을 이번 답사의 가이드북으로 삼을 참이다.
해가 먼 산으로 달음질하는 오후 5시 불국사에 도착했다. 한산한 시간에 여유 있게 둘러보려던 계획은 처음부터 어긋났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단체로 몰려다니는 관광객과 안내원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어린이들…. 그래도 가슴은 두근거린다. 학창시절 수학여행 이후 20년 만의 걸음이다.
청운교 백운교를 끼고 돌아 불국사 경내로 들어선다. 대웅전 앞마당에 우뚝 솟은 두 탑. 석가탑과 다보탑. 탑이야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으련만, 아주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느낌이다.
빙허는 다보탑을 ‘능라와 주옥으로 꾸밀 대로 꾸민 성장미인(盛粧美人)’으로, 석가탑을 ‘수수하게 차린 담장미인(淡粧美人)’으로 묘사했다. 그대로다. 나이가 든 때문일까. 첫 만남에선 첫눈에 사람을 잡아끄는 다보탑에 눈을 빼앗겼지만 이번엔 석가탑에 더 끌린다. 역시 아름다움은 화려함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석가탑에 얽힌 이야기는 탑을 더욱 신비롭게 만든다. 무영탑(無影塔)으로 불리는 석가탑에는 백제 석공 아사달과 부인 아사녀의 슬픈 전설이 남아있다. 탑이 완성되면 연못에 탑의 그림자가 비친다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 기다림에 지친 아사녀는 그만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만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실제 탑을 앞에 두고 보니 느낌이 각별하다.
해체된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인지 석가탑은 초췌해보였다. 탑신 곳곳은 깨지고 금이 갔고 탑을 든든하게 받치던 기단에는 커다란 틈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탑 안쪽의 흙이 조금씩 새어나와 안이 비어간다는 것이다. 더운 피가 흐르지 않는 석탑도 세월의 도도한 흐름을 어쩌지는 못하는 것이다.
한참을 홀린 듯 탑을 바라보고 섰다가 대웅전으로 눈을 돌린다. 조선 영조 43년(1767)에 다시 칠했다는 단청이 고색창연하다. 빙허가 글에서 “오늘날에도 조금도 빛이 변하지 않았다”고 경탄했던 바로 그 단청이다.
1000년고찰에선 모든 게 가르침이다. 사찰 동쪽의 소나무 숲. 제멋대로인 듯 규칙이 있고 얽매인 듯 자유롭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각각이지만 어느 하나 튀지 않는다. 내일 아침에도 태양은 그 숲을 지나 불국사 대웅전 마당으로 들어올 것이다. 1000년을 그래왔던 것처럼.
10월 하순 토함산 자락의 저녁은 금세 서늘한 기운이 감돈다. 어스름이 내리고 관람 시간 마감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텅 빈 절 안에서 어디선가 스님이 한 분씩 나타나 차례로 대웅전에 든다. 저녁 예불 시간이다. 그렇다. 수행정진하는 도량이라는 것을 깜박 잊고 있었다.
마당 한 쪽 법고 앞에 스님 한 분이 선다. 마음을 가다듬는지 몇 분이 흐르도록 미동도 없다. 한껏 당겨놓은 북 가죽처럼 팽팽한 적막감이 감돈다. 수행이 덜 된 속인은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 슬며시 발걸음을 떼었다가 발소리에 흠칫 놀랐다.
북이 울리기 시작했다. 빨라지다 달래듯 잦아들고 거세게 흔들다 가만가만 어루만진다. 속세로, 속세로 멀리 퍼져나가는 북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라고 한다. 조금의 주저함도, 지나침도 없는 몸놀림으로 마음 심(心)자를 그린다. 10여 분을 보고 서있자니 눈물이 핑 돈다. 무슨 연유인가. 가슴에 맺힌 것, 그것은 무엇이냐. 중모리로, 자진모리로 흐르던 북소리가 느려지더니 갑자기 멎었다. 북소리에 화답하듯 저 너머에서 은은한 범종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주위는 완전히 어둠에 잠겼다. 속인과 산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제 극락정토 불국(佛國)을 떠나 속계(俗界)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만나는 데는 또 얼마가 걸릴 것이냐. 나직한 염불 소리는 내게 놓으라, 놓으라고 말하는 듯한데 발걸음은 차마 안 떨어진다. 아직 멀고 또 멀었다. 올려다 본 하늘에 반짝, 별이 몇 개 빛났다.
글=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사진=강병기기자 arche@donga.com
커버스토리 >
-

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구독
-

만화 그리는 의사들
구독
-

이은화의 미술시간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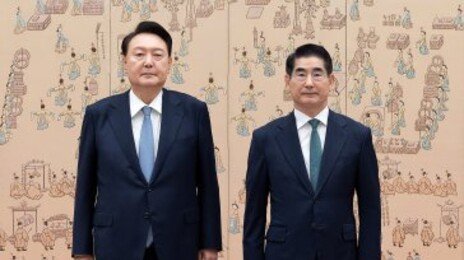

![[김순덕의 도발] 한동훈, ‘내란 수괴’ 탄핵에 정치생명 걸라](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622622.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