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개봉되는 초현실적인, 혹은 마술적인 느낌의 영화 ‘귀여워’(김수현 감독)에서 배다른 세 형제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두루 받아주는 스펀지 같은 여자 ‘순이’로 등장하는 것. 순이는 철거 직전의 서울 황학동 아파트를 배경으로 퀵서비스맨인 장남 ‘963’(김석훈), 견인차 운전사인 둘째 ‘개코’(선우), 조직폭력배인 막내 ‘뭐시기’(정재영), 박수무당인 아버지 ‘장수로’(장선우)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사각 애정행각을 벌인다.
비 오던 5일 밤 예지원을 만났다.
―실제 보니 얼굴이 아주 작네요.
“그런 거 같아요?(웃음) 화면에선 좀 커 보이거든요. 얼굴이 평면적이라, 클로즈업할 땐 얼굴이 스크린만 해지니까 더 그렇지요.”
―순이는 “모든 남자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라고 하죠. 동의하나요?
 |
―한 여자가 가족인 네 남자와 사랑을 하죠. 비현실적인데요.
“현실에선 영화보다 더 한 일도 있더라고요.”
―패륜 아닌가요?
“아니요. 그들이 사회에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들과 맞춰 살아본 적이 없고, 번듯한 직장도 다니지 못한 채 사회와 타협하는 법이 없죠. 하지만 ‘나쁜 놈’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영화는 속으로 들어가서 느낄 때와 한 걸음 떨어져 쳐다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도덕과 패륜의 구분도 그런 거 같아요.”
―순이는 ‘대자연의 어머니’인가요? 상처받은 남자들을 다 받아주고 치유해 주는… 순이는 ‘뭐시기’가 “저…, 가슴 좀… 만져 봐도” 하기가 무섭게 웃옷을 벗잖아요.
“순이는 네 남자를 남성으로도 좋아하지만 그들의 영혼을 좋아하는 거죠. 순이에겐 성행위 자체가 일종의 ‘보시’랄까. 남자들의 비어있고 공허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죠. 일반적인 도덕의 잣대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이번 영화도 그렇고 전작 ‘생활의 발견’도 그렇고, 예지원씨는 남자들에게 독특한 판타지를 심어줘요. 나도 사랑해 줄 것 같고, 또 다른 남자도 똑같이 사랑해 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품어준다면 저야 좋죠.(웃음) 하지만 이번엔 몸무게 늘리고, 얼굴도 일부러 부어있는 상태로 촬영해서…. 촬영 전날 음식을 조심하거나, 사우나에 가거나, 얼굴에 팩을 붙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 세상에는 없는, 야성적인 여자로 보이고 싶었거든요.”
―무용으로 단련된 다리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다리에 알이 박혀 어찌 보면 날씬하고 어찌 보면 되게 안 예뻐요. 하지만 꼭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 같은 여자로 보이고 싶었어요. 영화 ‘길’의 백치 여인 젤소미나처럼요. 사실 여자들은 (젓가락을 들어 보이며) 이런 다리를 좋아하는데….
―섹스 신에서 여배우들은 보통 ‘자기중심적인’ 느낌을 줘요. 반면 예지원씨는 ‘진짜 상대를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맞아요. 그래요. 전 ‘사람 타는’ 게 있어요. 좋은 작품과 환경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도 모르게 연애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만큼 사랑을 받는 것도 같고요. 촬영이 끝나면 우울증도 와요. 아, 이걸(사랑의 마음과 공허함) 어떻게 채워야 하지, 하고요. 지금도 만나면 너무 흥분이 돼요. 좋아서. 하지만 이건 단점이기도 해요. 좋을 땐 너무 좋아하지만, 그 반대가 될 때도 있거든요. 제가 단순해서 그래요. 그래서 단순한 순이랑 비슷해요. 정말 맹목적인 면이 있어요.”
―연기력에 비해 대중적 인기가 못 미치는 건 아닌가요?
“저의 운명이겠죠. 앞으로도 몸은 힘들지만 정신적으론 충만한 작품들을 할 거예요. 이 영화에서 순이는 ‘어쨌든 좋았어. 모두가 날 좋아해주고. 아무도 날 궁금해 하지 않고’라고 하잖아요. 제 심정이 그래요. 사람들이 배우에게 열광하다가도 과거에 연연하고 사소한 걸로 돌아서 버릴 때가 있거든요.”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배우’ 장선우… ‘귀여워’ 박수무당 아버지역 열연▼
 |
“잠겨서 지내고 싶었지만 이런 게 다 인연인 것 같아요. 배우 하니까 참 좋아요. 수평적 관계에서 배우들과 얘기하는 것도 좋고, 수다도 늘었고.”
‘귀여워’가 첫 연출인 김수현 감독은 ‘너에게 나를 보낸다’ ‘꽃잎’ ‘나쁜 영화’ 등 장 감독의 전작 영화들에 연출부나 조감독으로 참여했던 인물. 그는 “이젠 감독님이 나를 도울 차례”라며 장 감독에게 배역을 제안했다.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했지만 촬영장에서 ‘선배 배우님’들이 이끌어주셔서 재밌게 지낼 수 있었어요. 현장에서 내 신조는 말 잘 듣는 배우가 되자는 거였죠.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웃음)
이 영화에서 세파에 찌든 주름살 많은 장 감독의 얼굴과 천진난만에 가까운 그의 무표정, 그리고 나른한 목소리로 우물쭈물 던지는 “신이 내리면…, 언제부턴가 내겐 꿈이 있었거든”과 같은 대사는 서로 묘하게 어울리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한다.
“옥상에서 순이가 부적을 태우는 순간 불꽃이 터지는 라스트 장면은 상당히 행복하게 느껴졌어요. 순간 나보다 더 나은 감독이 탄생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1980년대 중반 혜성처럼 나타나 ‘한국 뉴웨이브의 출현’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장 감독. ‘우묵배미의 사랑’(1990년) ‘꽃잎’(1996년)과 같은 선 굵은 영화와 동시에 변태적인 성행위 묘사로 두 번이나 등급보류판정을 받은 ‘거짓말’(2000년) 등으로 바람 잘날 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의 장차 행보가 주목된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씨네인터뷰 >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사설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피플]영화 ‘엑스팻츠’ 내년 한국촬영…재미감독 진원석씨](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4/11/16/693335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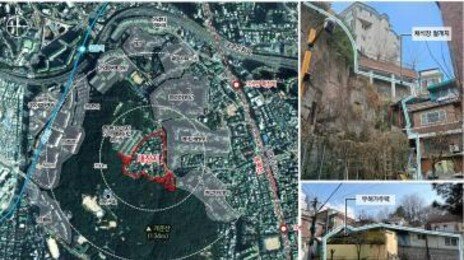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