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뒤쫓아 가 사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뒤따라온 부장(副將)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고에게 재촉하듯 물었다. 정고가 아직도 제대로 정신을 못 차린 듯 어정쩡한 얼굴로 말했다.
“내버려 두어라. 적장은 이름 없는 졸개(무명소졸·無名小卒)였다. 한줌도 안되는 이름 없는 졸개들을 잡자고 저물어가는 골짜기로 대군을 몰아넣을 수는 없다.”
그리고는 군사를 물려 초나라 진채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한편 범 아가리를 벗어나듯 초나라 군사들의 추격에서 벗어난 한왕은 그 골짜기를 밤이 깊도록 내쳐 달리다가 삼경을 넘기고서야 인근 풀숲에서 잤다.
“수수를 건너 관중(關中)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면 차라리 패현(沛縣)으로 가자. 아버님 어머님과 가솔들이 모두 그곳에 있으니 어차피 데려와야 한다. 또 그들에게 딸려 보낸 심이기(審食其)가 약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우리에게 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날이 밝자 밤새 궁리를 짜낸 한왕이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들판으로 나가 패현으로 가는 관도(官道)를 찾았다.
“언제나 가장 빠른 길은 관도가 된다. 다행히 우리 모두 말이 있으니 관도로 달리면 저물기 전에 패현에 이를 수 있다.”
그러면서 앞서 골짜기를 나가는 한왕을 지치고 주린 여남은 기가 뒤따랐다. 오래잖아 한줄기 북쪽으로 곧게 닦여진 길이 나왔다. 한왕 일행이 반가워하며 그 길로 들어서려는데, 갑자기 한 사졸이 손가락을 들어 남쪽을 가리켰다.
“저기, 저게…무엇인지요?”
그 소리에 모두 보니 관도 남쪽에서 수레 한 대가 보얗게 먼지를 날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어찌나 빠른지 잠시 보고 있는 사이에 크기가 배로 늘어날 지경이었다.
“누군지 몹시 급한 모양이구나. 수레 모는 솜씨가 대단하다. 하후영에게도 지지 않겠다.”
달려오고 있는 수레를 군사들과 함께 바라보고 있던 한왕이 불쑥 그렇게 말했다. 그래놓고 다시 하후영이 떠올랐던지 눈시울이 불그레해져 중얼거렸다.
“싸움수레(전차·戰車)를 몰고 적진으로 돌진했다더니 그 몸이라도 성한지….”
그런데 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바람처럼 관도를 달려오던 수레가 갑자기 한왕 일행 앞에 와서 멈춰 섰다. 그리고 어자(御者) 자리에서 하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한 작달막한 사내가 뛰어내려 한왕에게로 달려갔다. 바로 하후영이었다.
“신 하후영이 문후 드립니다. 대왕께서는 그간 무양하셨습니까?”
하후영이 한왕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울먹였다. 한왕도 말에서 뛰어내려 하후영의 손을 잡으며 목멘 소리로 받았다.
“살아 있었구나. 나를 두고 죽었으면 내 결코 너를 용서하지 않았으리라!”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사설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五.밀물과 썰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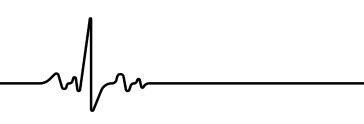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