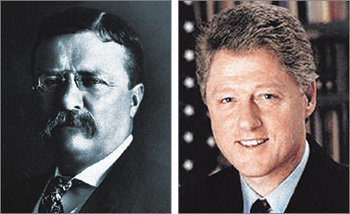
파리는 일주일을, 거북이는 100년을 산다. 모든 생물은 살면서 노화를 겪는다. 하지만 왜 노화 속도가 생물마다 다른지, 그 속도를 늦추려면 무얼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은이 어스태드는 하버드대 생태학 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텍사스대 의대의 노화연구팀을 이끌고 있다. 여러 노화 연구가 주로 세포나 생화학 차원에서 진행돼 왔지만 그의 경우 진화의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하고 있다. “길어도 20년 안에 생의학 쪽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노화 속도를 다스리는 약품이 나올 것이다. 인간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 내기해도 좋다. 1900년에 미국인의 기대수명은 불과 마흔여덟 살이었다. 지금 누가 그 나이에 장수했다고 하겠는가?” 어스태드 교수의 말이다.
생명보험회사들의 생명보험료는 대략 8년마다 두 배가 된다. 1980년대 미국 여성이나 석기시대처럼 살아가는 폴리네시아의 원주민들 모두 사망률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똑같이 8년이다. 인간은 수천 년 동안 환경과 위생을 향상시켜 왔다. 하지만 몸이 쇠퇴하는 속도는 조금도 다스리지 못한 것이다.
왜 늙는지 이유를 따지는 이론은 수백 가지가 넘는다. 이 중 중요하게 취급돼 온 ‘종(種)의 이익’ 이론은 “노화가 이뤄져야 세대교체가 이뤄진다. 그러면서 변이가 일어나야 종에 이익이 된다”는 견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죽음과 노화를 혼동하고 있다.
‘생명 속도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쥐처럼 연료를 빨리 소비하면 빨리 죽고, 거북이처럼 천천히 소비하면 오래 살 것이라는 견해다. 이는 생명체를 너무 단순하게 본 것이다. 새들은 포유류에 비해 생체 대사 속도가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평균수명은 포유류의 세 배 이상이다.
어스태드 교수가 지지하는 쪽은 ‘노화의 진화’ 이론이다. “생물의 종마다 노화 속도가 다르다. 이는 진화와 관련이 있다”라는 설명이다. 어스태드는 “노화와 더 잘 싸워 이기도록 진화한 종을 연구하면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고래와 코끼리는 암에 거의 걸리지 않는다. 새들은 몸에 나쁘다는 산화와 갈색화를 훨씬 많이 겪으면서도 포유류보다 더 오래 산다.(산화와 갈색화는 산소 호흡으로 각각 산소와 포도당을 소비할 때 몸에서 일어난다)
한편 어스태드 교수는 현재는 노화를 막는 어떤 방책도 없다고 단언한다. “칼로리를 줄이라” “운동하라”는 제안은 쥐 실험에서는 효과가 증명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의 갖가지 변수를 고려하면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지켜볼 때 노화 방지책이 머잖아 나올 것이라는 낙관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수명을 두 배 연장한 초파리, 다섯 배 이상 연장한 생쥐들이 연구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람이라고 그러지 못하겠는가.
원제는 ‘Why we age’(1997년).
권기태 기자 kkt@donga.com
자연과학 >
-

오늘의 운세
구독
-

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자연과학]‘살아있는 지구의 역사’… 지구, 너를 알고 싶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1/14/6937702.1.jpg)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37250.1.thumb.pn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