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전시대에 자유주의는 우리에게 그냥 사회주의의 반대, 곧 반공주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붕괴로 자유주의의 외부 적이 사라지면서 자유주의 내부의 분화가 시작됐어요. 뉴 라이트 운동도 그런 내적 분화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4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서구 자유주의를 그 핵심적 요소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축으로 새롭게 분류했다.
그는 먼저 ‘자유시장의 최대화, 정부의 최소화’로 요약되는 시장 우선적 자유주의자들을 ‘자유지상주의자’로 묶었다. 하이에크의 오스트리아학파, 프리드먼의 시카고학파, 뷰캐넌의 버지니아 공공선택학파 등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로버트 노직, 존 호스퍼스와 같은 자유지상주의 철학자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경험적 유용성의 관점에서 시장을 옹호한다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시장이 아닌 국가의 개입에 의한 부의 재분배는 결국 가난한 사람을 위해 부유한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칸트의 정언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시장의 정당성을 내세우죠.”
자유지상주의자에게는 사유재산권은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다. 사유재산권이야말로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우선 권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주의 우선적 자유주의자(민주주의자)들에게는 사유재산권보다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자결권과 이를 정치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시장과 민주주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유주의자들’로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와 로널드 드워킨, 독일의 비판이론가 하버마스를 들었다. 이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국부론)만큼 사회적 책임이라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도덕감정론)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자유주의를 선택해야 할까.
“자유지상주의자는 공공성의 취약을 낳고, 민주주의자는 비효율성의 함정에 빠집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요.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양대 바퀴로 맹목적 근대화를 추구했을 뿐 정작 그 내용을 무엇으로 채워 갈지는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고민을 시작할 때입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북카페 >
-

2030세상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북카페]‘행복한 허무주의자의…’ 펴낸 박이문교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1/21/693819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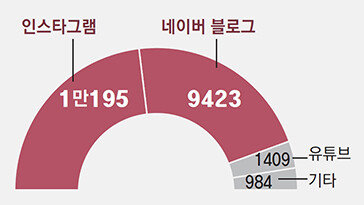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