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쪽의 인도-호주 지각판과 동쪽의 유라시아 지각판에 속한 버마판이 바다 밑에서 서로 충돌했다. 이 충돌로 인도-호주 지각판이 버마판 아래로 밀려들어가 버마판을 밀어올렸고 그 위의 바닷물이 솟아올랐다. 진도 9의 강진과 함께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했고, 그 결과는 이미 알려진 대로 15만 명 이상이 희생당하는 참상이었다.
이번 지진해일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땅의 움직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며, 마치 지구를 점령한 듯한 인간이 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영국자연사박물관 수석 고생물학자인 저자는 이미 그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 책은 인류가 발붙이고 사는 땅, 즉 지구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런데 지구의 특성을 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지구 표면을 구성하는 거대한 6개(작은 것까지 치면 12개)의 지각판이다. 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세계는 지각판들의 명령에 따라 변한다’고 서두부터 말한다. 이 명령을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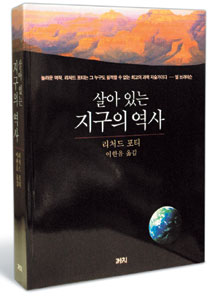
|
그 명령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전달된다. 처음에 대륙이 갈라지고 새로운 바다가 형성되었다가 나중에 조산대(造山帶)를 형성하면서 바다가 다시 닫히는 지각판들의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1965년 ‘네이처’지에 지각판 개념을 처음 제기한 캐나다의 지구물리학자 투조 윌슨의 이름을 따 ‘윌슨 주기’라 불리는 이 운동은 대략 2억 년이 넘게 걸린다. 지구 나이 45억 년은 곧 윌슨 주기의 거듭된 반복인 셈이다.
이 주기 안에서 조용해 보이는 땅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방식으로 불규칙하게 진동한다. 땅 표면은 팽창하고 수축하며 바다는 올라오고 내려간다. 대륙 자체도 움직인다. 지각판들을 다닥다닥 이어 붙인 것과 같은 바닥을 갖고 있는 지중해는 아프리카 대륙이 유럽 쪽으로 3000만 년 정도만 더 밀고 들어가면 사라지게 된다. 대양과 산도 지구라는 모자이크 그림에 끼워진 지각판들의 배열에 불과하다. 지각판들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재배치된다.
이 책의 묘미는 이런 땅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정확하게 서술했다는 데 있다. 딱딱한 교과서처럼 개념 중심이 아니라, 저자가 직접 가본 특별하고 특정한 장소, 지질과 역사가 뒤얽힌 곳들을 통해 지각판의 구조와 실체, 그리고 운동을 풀어냈다. 서기 79년 폼페이를 멸망시킨 이탈리아 나폴리의 베수비오 화산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여정은 하와이와 알프스 산맥을 거쳐 북아메리카의 뉴펀들랜드 제도와 미국 서부 해안의 샌안드레아스 단층, 스칸디나비아의 칼레도니아 산맥,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까지 두루 거치며 커다란 지구 그림을 그려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땅이 인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알게 된다. 거칠게 말하자면 땅을 구성하는 암석에 따라 그곳의 기후와 자연풍광, 그리고 농경과 유목 등 생활방식이 결정된다. 물론 암석은 지각판의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 발밑의 암석은 지구의 얼굴 안쪽에 자리한 무의식과 같으며, 그 얼굴의 분위기와 인상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카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처럼 지표면에 사는 우리는 더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에 얽매여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분명 과학서적이지만 묵시록의 분위기가 풍긴다. 거대한 지구의 섭리도 제대로 모른 채 기고만장한 인간에 대한 경계가 책 군데군데서 묻어난다. 저자는 ‘바다가 낮아지고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불어난, 기생하는 진드기’와 같은 인류는 ‘자신에게 맞는 겸손함을 더 갖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랴. 남아시아 지진해일의 참상은 벌써 우리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원제는 ‘The Earth-An Intimate History’(2004년).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자연과학 >
-

세종팀의 정책워치
구독
-

이헌재의 인생홈런
구독
-

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자연과학]‘키의 신화’… 인간의 키를 보는 문화적 관점](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1/21/6938200.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