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의 척후다. 우리를 알아보면 바로 꼬리를 사리고 달아나 형양성 안에 처박힐 것이다.”
그러면서 싸울 채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곧 초군 선두가 놀랄 일이 벌어졌다. 앞장서 달려오는 기마대에 이어 한 부대 한 부대 달려오는 한군은 결코 적정만 살피고 되돌아가려는 척후대의 규모가 아니었다. 그제야 놀란 초군 선두가 급하게 싸울 채비를 갖추는데 다시 함성과 함께 기마대를 앞세운 한군의 두 번째 물결이 밀려들었다.
한군은 한번 멈칫하는 법도 없이 곧바로 초군 선두를 덮쳐 왔다. 하지만 아직도 초나라 군사들은 사태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했다.
“한군이 정면에서 치고 든다고? 저것들이 무얼 잘못 먹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렇게 이죽거리기까지 했다.
초나라 군사들에게 한군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부터 코웃음부터 나는 군대였다. 먼저 그들이 한군을 얕보는 까닭은 홍문(鴻門)에서 패왕에게 비루한 목숨을 빌어 겨우 파촉(巴蜀) 한중(漢中)으로 쫓겨 들어간 한왕 유방의 군사들이라는 점이었다. 거기다가 팽성 싸움에서 그들이 겪은 한군은 또 얼마나 힘없고 겁 많은 잡동사니 군대였던가.
하지만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싸움에 진다(輕敵必敗)고 했던가, 그런 초군의 얕봄과 방심이 패배를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했다. 뒤따르는 우군에게 알려 앞뒤가 어우러진 대응을 하는 대신 행군하는 차례로 적과 맞서간 때문이었다. 한신이 처음부터 바란 대로였다.
패왕과 초나라 군대가 즐겨 썼던 그 속도와 집중에 거꾸로 당해 용저가 이끄는 초나라의 전군(前軍) 3만이 한 줄로 나아가며 차례로 무너지는 동안에도 뒤따라오던 종리매의 후군(後軍)은 행군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가 황망히 쫓겨오는 초군이 늘어나자 종리매가 전령을 풀어 알아보게 했다. 하지만 전령이 돌아오기도 전에 넋 빠진 듯 깃발도 잃고 단기(單騎)로 쫓겨온 용저가 종리매의 장군 기(旗)를 알아보고 달려와 말했다.
“장군, 아무래도 적의 계략에 걸려든 것 같소. 적은 처음부터 농성전(籠城戰)이 아니라 복격전(伏擊戰)을 채비하고 있었던 듯하오. 어서 군사를 물려 적의 매복지에서 빠져나가야겠소!”
용저는 한군의 공격이 난데없고 또 매서워 대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일시에 들이친 걸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용저가 바로 알았건 잘못 알았건 이미 때는 늦어 있었다. 그 사이에 용저의 전군을 모두 흩어 버린 한군이 다시 종리매의 후군을 덮쳐 오고 있었다.
“겁내지 말라. 적은 수수 가에 수십만 시체를 버려두고 쫓겨갔던 잡동사니 한군이다. 모두 돌아서 적을 쳐라! 유방을 사로잡아 천하를 우리 대왕과 서초(西楚)의 것으로 하자!”
하지만 씩씩한 것은 종리매의 외침뿐이었다. 그날 경현과 삭정 사이의 싸움에서 한군에 무참하게 무너진 용저와 종리매의 군사들은 30리나 정신없이 쫓기다가, 그곳에서 1만 군사로 뒤를 받치고 있던 환초의 구원을 받아서야 겨우 한군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밤 하루 낮을 달아나 곡우에 이르러 보니 남은 군사는 3만에도 차지 않았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고양이 눈
구독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五.밀물과 썰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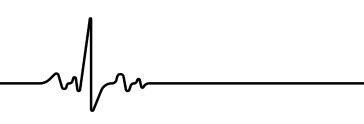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