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봉되는 ‘레드 아이’에는 ‘공포영화의 정도(正道)를 간다’는 미덕이 있다. 얼토당토않은 반전에 집착하지 않을 뿐더러, 불쑥 큰 소리로 관객을 놀라게 한 뒤 이걸 무섭게 만든 걸로 착각하는 ‘깜짝 놀랐지 증후군’을 보이지도 않으니 말이다. 희생자들은 죽을 시점에 죽고, 귀신은 나타날 시점에 나타나고, 관객은 놀랄 타이밍에 놀라는 이 영화는 정직하다. 하지만 이 영화엔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무섭지 않다는 점이다.
극중 인물들은 “어쩌면 우리는 당시 그 혼령들과 달리는지도 몰라요” 하고 조바심내지만 정작 관객은 내용을 뻔히 짐작할 수밖에 없는 이 영화가 공포영화로서 걸 수 있는 승부처는 세 곳이다. 하나는 열차라는 폐쇄공간의 공포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고, 둘은 미선과 찬식의 안타까운 사연에 집중해 페이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며, 셋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창조적 귀신과 죽음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레드 아이’는 셋 다 절반의 성공이요, 절반의 실패다. 열차란 공간은 관객을 압박하지 못하고 열려 있으며, 공포 이미지는 다소 관습적이다. 뭔가를 말하려다 뚝 끊기는 느낌이 드는 것은 미선에 얽힌 이야기라는 줄기 사연을 물고 들어가는 구심력이 약할 뿐 아니라, 밝혀지는 미선의 가족사 자체도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꽃피는 봄이 오면’에서 여린 듯 진한 존재감을 보여준 장신영은 예쁘고 착하게 보이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깊고 좀 더 차가우며 좀 덜 낙천적으로 보였어야 했다. ‘링’(일본영화 ‘링’의 리메이크)의 김동빈 감독 연출. 15세 이상 관람 가.
이승재 기자 sjda@donga.com
씨네리뷰 >
-

부동산 빨간펜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씨네리뷰]어썰트 13…믿을수 없는 그러나 믿어야하는 敵](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7/07/694967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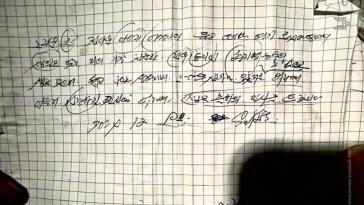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