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하며 부부 간 불화가 없다는 점에서 약간은 전형에서 벗어나 있다.
“아이는 어학에 뛰어났어요. 유치원 다닐 때 아내가 일본어를 말하는 것을 듣고 수첩에 일본어를 적어 일어사전을 만드는가 하면 70세 넘은 할아버지와 일본어로 얘기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9시 뉴스를 보고 요약해 얘기해 주고요.”
영재가 아니냐는 질문에 최 교수는 “수학을 싫어하고 잘하지도 못하며 사회성도 부족하다”고 부인한다.
최 교수가 아이의 어학연수를 결정하게 된 것은 아이가 지난해 초 ‘국제어인 영어를 배워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다’는 꿈을 얘기하면서부터. 최 교수 부부는 ‘자식이 언어에 소질이 있다면 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에게 전혀 영어를 가르치지 않았던 최 교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에야 영어학원에 보내 알파벳을 익히게 한 뒤 1학기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캐나다로 보냈다. 아내 역시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란 생각에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최 교수는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하기로 했다. 집을 전세 주고 작은 집에 전세 들면서 안방을 연구실로 꾸몄다. 거실엔 응접세트 대신 피아노를 놓았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 것은 쓸쓸함을 달래려는 것이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 것은 작가수업을 위해서다.
“5∼10년 후 작가가 되는 학위를 딴다는 생각으로 인문사회과학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분야의 첫 책은 ‘매력적으로 나이 드는 법’일 겁니다.”
한국인들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최 교수는 오랜 독일유학 생활과 늦은 결혼으로 홀로서기 연습도 잘돼 있다.
한국어를 잊지 않고 부정(父情)을 느끼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솝우화 한 편씩을 첨부해 e메일을 보낸다. 아이는 한두 줄로 느낌을 적어 보낸다. 국어실력이 좋아진 것 같다. 아이는 ‘냉면만 드시지 말고 밥도 챙겨 드세요’하며 제법 아빠 걱정까지 한다. 일주일에 두 번 화상채팅도 한다. 결혼 10년 만에 아내로부터 연애편지도 받아봤다.
“6개월간 가족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혼자 식당에 들렀다 다른 가족이 모여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 아내와 아이가 더욱 생각나 가슴이 찡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옆에 있으면 잘 잊어버리잖아요.”
최 교수는 기러기 아빠의 문제는 한국의 교육문제가 낳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족이 떨어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2년 이상이면 떨어져 있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고 장래를 위한 좋은 투자까지 된다면 해볼 만한 것이 아닐까요.”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다시 가족이다 >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

김도연 칼럼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다시 가족이다]우리집은 일곱 식구](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3/20/6942226.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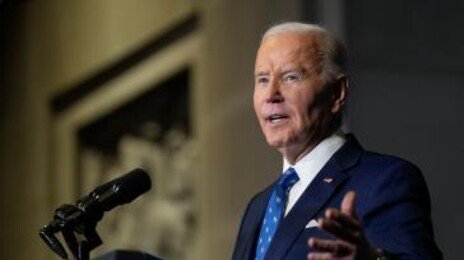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