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단 정보통신산업을 선도한다면서도 호주제-국가보안법-역사청산 등의 문제로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근대·근대·탈근대가 중첩된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역사 시계’가 어디쯤을 가리키고 있는지 냉철히 인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의 시대의식이 병존하는 것은 뒤늦게 근대화의 길을 치달아 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과거와 어느 정도 단절해야 더 효율적으로 미래를 열어 갈 수 있을까, 혹은 전통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나아가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 정말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전근대’ 사회 속에서 과거와의 단절을 과감히 시도했던 조선후기의 혜강 최한기(惠崗 崔漢綺)와 이른바 ‘탈근대’ 문화의 중심인 미국 뉴욕에서 지금도 ‘근대’의 과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마셜 버먼(뉴욕시립대 교수·평론가)은 이런 난제 해결을 위한 좋은 선례를 보여 준다.
최한기는 서양 관련 서적을 섭렵해 익힌 최신 지식을 바탕으로 ‘감히’ 경전(經典)을 무시한 채 독자적 체계를 갖춘 저술을 연이어 내놨다. 그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학(氣學)’은 손병욱 교수(경상대·한국철학)가 1992년 첫 번역본을 내놓은 뒤 2004년 신중하게 재번역한 개정판(통나무)을 펴내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우주의 구성 방식부터 인간사회의 운영원리까지 일관된 이론체계를 혼자의 힘으로 구축하려 했던 그는 당시 누구보다도 ‘근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리체계’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의 철학 속에도 ‘오륜(五倫)’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은 여전히 변치 않는 요소로 남아 있다.
이른바 ‘탈근대’라는 것은 미완성된 ‘근대화’의 연속일 뿐이라는 주장을 담은 버먼의 저서 ‘견고한 모든 것은 대기 속에 녹아 버린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가 출간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서구사회에 풍미하던 1982년이었다. 한국에서 1994년 ‘현대성의 경험’(현대미학사)이란 제목으로 초역 출간된 이 책은 버먼을 아끼는 사람들에게서 ‘오역투성이’란 오명을 얻은 뒤 개정판(1998년), 재번역판(2004년)을 거치며 오명에서 간신히 벗어났다.
버먼에게 ‘근대화’란 기존의 견고한 질서를 무너뜨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그 새로운 사회가 다시 견고한 억압 장치로 변모하면 다시 그것을 무너뜨려 가는 과정이다. 그는 파우스트의 욕망과 마르크스의 혁명에서 그러한 ‘근대성’의 생명력을 보았고, 뉴욕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한다. 그에 따르면 ‘뉴욕’이 ‘뉴욕’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맨해튼의 빌딩 숲이 아니라 끊임없이 불도저가 ‘뉴욕’을 때려 부수고 있는 역동성이다.
두 사람이 택한 길은 서로 달랐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절 또는 파괴를 통해서라도 능동적으로 현실의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그 단절과 파괴의 이면에는 ‘관계’ 중심의 유교적 가치관(최한기)이나 ‘개인’의 자유(버먼)와 같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가치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김형찬 고려대 연구교수·동양철학 kphilos@empal.com
3人3色 >
-

딥다이브
구독
-

사설
구독
-

정미경의 이런영어 저런미국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3人3色]시인의 상상력, 詩 안에만 가두지 말라](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4/22/6944527.1.jpg)
![前 美대사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엄 직후 심각한 우려”[데스크가 만난 사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819406.5.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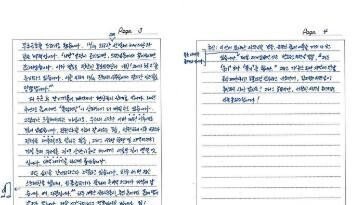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