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해 3월 다시 한왕 유방이 다섯 제후를 앞세우고 팽성으로 쳐들어왔을 때 경포는 그 엄청난 기세에 눌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패왕을 도울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홀로 한왕의 56만 대군과 맞설 자신이 없어 형세만 살피고 있는데, 패왕이 정병 3만을 이끌고 달려와 단숨에 그들을 산산조각 내버린 탓이었다. 도무지 경포가 끼어들어 생색을 낼 틈이 없었다.
한왕 유방이 수십만 대군을 잃고 겨우 목숨만을 건져 관중으로 달아났다는 말을 듣자 경포는 다음을 자기 차례라 보았다. 몇 해 곁에서 함께 싸우면서 경포가 알고 있는 항우는 두 번이나 의리를 저버린 자신을 결코 용서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무슨 변덕인지 항우는 사자를 보내 좋은 말로 달래기만 해 경포를 헷갈리게 했다.
방금도 그랬다. 패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사자를 보내 경포의 출전만을 재촉할 뿐이었다. 그러나 장강의 수적(水賊)으로 늙은 경포로서는 이제 와서 그런 패왕을 믿고 선뜻 군사를 내어 따라나설 수가 없었다. 거기에 다시 한왕 유방의 사자가 불쑥 찾아오니, 경포의 머릿속은 더욱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경포는 우선 한왕의 사자 수하(隨何)를 고향 사람인 태재에게 맡겨 접대하게 했으나, 당장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다. 날마다 태재를 불러 수하 일행의 움직임을 세밀히 캐물으면서도 사흘이 되도록 수하를 만나 보려 하지 않았다. 경포가 주인을 정해주고 대접하게 하며 살필 뿐, 만나보지 않기는 패왕에게서 온 초나라 사자도 마찬가지였다.
사흘이 되어도 구강왕의 부름이 없자 이번에는 수하 쪽에서 가만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수레에 싣고 온 재물을 풀어 태재의 집안사람들 마음부터 산 뒤 다시 따로 마련해둔 보화를 태재에게 바쳐 한나라의 넉넉한 물력(物力)을 은근히 내비쳤다. 소금 먹은 놈이 물켠다고, 한 재물을 얻은 태재가 가만있지 못하고 수하를 안으로 청해 들였다.
“제가 지금은 한나라의 사자로 왔습니다만 실은 저도 귀국의 대왕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은 육현(六縣)이 고향입니다.”
차려진 술상에 마주 앉으며 수하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했다. 수하는 이미 태재가 자신과 같은 고향 사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짐짓 그렇게 능청을 떨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태재가 반색을 하며 받았다.
“나도 육현 사람이오. 왠지 어디선가 본 듯하다 싶었더니 그래서였구려.”
그리고는 한층 가까운 느낌이 드는지 수하에게 다가와 술잔을 권했다. 사양 없이 잔을 주고받던 수하가 불쑥 태재에게 물었다.
“오늘로 구강에 이른 지 사흘이 되는데 아직도 대왕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니 무슨 일입니까? 혹 대왕께나 조정에 무슨 변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오늘의 운세
구독
-

병을 이겨내는 사람들
구독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五.밀물과 썰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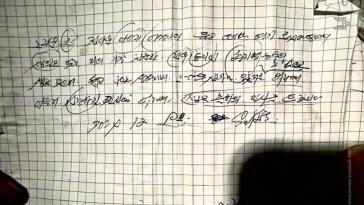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