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초와 계포가 오창을 에워싸고 들이치는데 그 기세가 여간 사납지 않습니다. 조참 장군이 힘을 다해 지키고 있으나 항왕의 본진이 오면 버텨내기 어려울 듯합니다. 대왕의 원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오창에서 형양에 이르는 용도(甬道)를 끊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발 장군이 이리저리 달려가 막고 있으나 적이 여러 갈래인데다 그 기세가 날카로워 용도를 지켜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형양에서 한 갈래 군사를 내어 주발 장군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왕으로서는 조른다고 함부로 군사를 내주기도 어려웠다. 패왕의 싸움이란 게 대개가 집중된 힘으로 질풍처럼 적의 심장을 찔러가 한 싸움으로 결판을 내버리는 식이었다. 여기저기 군사를 떼어 보냈다가 돌연 패왕이 한왕이 있는 형양으로 전력(戰力)을 집중해오면 팽성에서 겪은 것보다 더한 낭패를 당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한왕도 형양 성안으로 전력을 긁어모아 천하의 형세가 유리하게 바뀔 때까지 버텨보기로 했다.
한왕은 먼저 조참이 오창을 잃거나 주발이 용도를 지켜내지 못해 양도(糧道)가 끊어질 때를 대비했다. 성안에 갈무리된 군량을 아껴 먹게 하는 한편 인근의 가축을 성안으로 끌어다 두고 급할 때 잡아 쓸 수 있게 했다. 또 성안 백성들 중에도 싸움을 거들 수 있는 남자는 따로 헤아려 정히 성이 위태로우면 성벽위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해두었다.
한왕은 그래놓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다시 장량을 불러 물었다.
“대장군 한신과 상산왕 장이에게도 사람을 보내 회군(回軍)을 명하는 것이 어떻겠소?”
하지만 장량은 가만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제 와서 대장군과 상산왕을 불러들이면 일껏 얻은 조(趙)나라와 연(燕)나라는 다시 항왕에게로 넘어가고 맙니다. 이곳 형양이 이제껏 평온했던 것도 대장군이 항왕의 이목을 그쪽으로 돌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대장군은 형양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제(齊)나라로 내려가 항왕의 등 뒤를 노려주는 것이 오히려 형양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허나 지난번 팽성에서 그랬던 것처럼 형양이 항왕에게 떨어지고 과인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한신이 제나라가 아니라 서초(西楚)를 몽땅 둘러엎는다 해도 무슨 소용이겠소?”
“형양 성고 오창에 있는 한군(漢軍)만도 10만이 됩니다. 그들이 기각지세(기角之勢)를 이루며 높고 든든한 성에 의지해 지키는데 아무려면 그리 되기야 하겠습니까?”
장량이 그렇게 안심시켰으나 한왕의 마음은 무겁고 어둡기만 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팽성 싸움에서 한왕이 마음에 입은 상처가 그만큼 컸다고 할 수도 있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이호 기자의 마켓ON
구독
-

영감 한 스푼
구독
-

사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五.밀물과 썰물](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횡설수설/이진영]무모한 ‘계엄 망상’ 언제 싹 텄을까](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724326.2.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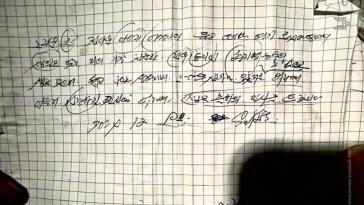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