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기획초대전으로 열리는 그의 작품전 ‘숨결’전은 ‘추상화’ 작업 45년의 세계를 모두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 전시. 대표작 60점과 신작 10점이 나온다.
윤 화백은 1970년대 유화가 마르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 그림 표면에 금이 가도록 놔두는 기법의 ‘균열’ 시리즈를, 1980년대엔 빠른 붓질과 자유롭고 헐겁게 구성된 화면으로 특징화된 ‘얼레짓’ 연작을 보여 왔다. 1990년대에는 거칠고 호방한 붓 자국과 캔버스에 넘쳐 나는 안료의 흔적을 보여주는 ‘익명의 땅’ 시리즈를 선보였다.
그러다 5년 전인 2000년 ‘겸재 예찬’ 시리즈부터는 유화 대신 쇳가루로 그림을 그려왔다. “컴컴하고 조심스럽던 청년시절 끓어오르던 감정을 곰삭히면서 겸재(정선)가 펼쳐 놓은 동양화의 세계로 들어앉았다”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
 |
서양화와 동양화, 표현과 사유, 세계 속의 우리 것 사이에서 고민하며 치열하게 작업해 온 그의 일생은 변화와 질곡 많은 한국 현대사와도 궤를 같이한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전쟁과 보릿고개의 험난한 세월을 넘어야 했던 청년 화가의 1960년대 작품은 총탄을 맞은 상흔처럼 어둡고 암울하고 울분에 차 있었다. 윤 화백은 국전의 권위에 반대하는 의미로 김종학, 김봉태 같은 이들과 함께 1960년 미협을 결성하고 덕수궁 담벼락을 미술관 삼아 작품을 내건 ‘1960년 미협전’을 열기도 했다.
분노와 좌절로 가득했던 청년 윤 화백에게 새로운 자극을 준 것은 1969년 1년간 록펠러재단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풍요의 땅 미국에서 느낀 열등감도 깊었지만 현대미술의 다양함을 접하면서 그는 ‘무엇을 그릴까’보다 ‘어떻게’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한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만들어 내려는 작가의 노력은 한국화의 지필묵 대신 쇳가루와 아크릴 물감, 브러시와 나이프로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그림, 서양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회화를 만들어 냈다.
 |
그의 근작들은 색상이 한층 단순해졌고 심상 속 풍경을 구성하는 바위와 나무, 계곡, 물소리 등의 파장은 작아진 듯하지만 화폭의 떨림과 울림은 훨씬 깊다.
스스로를 “세잔과 겸재 사이를 오가는 작가”라고 일컫는 윤 화백의 말은 “겸재가 서양미술에서 세잔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서양을 아울러 고민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말이기도 하다.
이 다양한 이미지 범람의 시대에 그는 마치 현대 작가로 환생한 겸재이기를 꿈꾸며 자신만의 몽환적인 산수를 펼쳐 내고 있는 것이다. 전시는 30일까지. 02-720-1020
허문명 기자 angelhuh@donga.com
전시 >
-

어린이 책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밑줄 긋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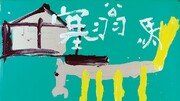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