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탄주는 맥주에 양주나 소주를 넣어 만들지만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는 ‘비어 칵테일(beer cocktail)’이라는 색다른 ‘폭탄주’가 유행하고 있다. 비어 칵테일은 맥주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은 폭탄주와 같으나 레몬 보드카 브랜디 등을 약하게 탄다는 점이 다르다. 그만큼 종류도 다양해 개성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 “폭탄주 칵테일, 가볍게 즐겨요.”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의 이소정(28·여) 대리는 대학 친구들의 ‘폭탄주 한 잔’ 부름이 마냥 반갑다. 술은 약하지만 그 모임에서 폭탄주는 비어 칵테일을 말하기 때문. 올해 초만 해도 모임에선 꼭 정통 폭탄주가 등장해 분위기를 망쳤으나 최근에 주종이 비어 칵테일로 바뀌었다.
이 대리는 “비어 칵테일을 마시자는 한 친구의 제안이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며 “모임에 폭탄주가 빠지는 게 아쉽다던 남자 동기들도 비어 칵테일을 유쾌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사내에 폭탄주 대신 비어 칵테일을 마시자는 모임이 생긴 곳도 있다. 홍보대행사 ‘프레인’의 PR 컨설턴트 박숙용(29·여)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바에서 맛본 비어 칵테일에 매료돼 여성 동료 5, 6명과 정기 모임을 만들었다. 박 씨는 “폭탄주를 마신 다음 날 업무를 제대로 못 보는 음주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비어 칵테일은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게 장점”고 말했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바 앤드 레스토랑 ‘오킴스’의 바텐더 양승철(31) 씨는 “‘폭탄주 칵테일’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르며 찾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한 번 맛본 손님들은 계속 찾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 “집에서도 만들어요.”
비어 칵테일은 기본적인 종류만 50종이 넘는다.
비어 칵테일의 또 다른 장점은 집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것. 국제칵테일교육학원의 김두연(31) 주임강사는 “비어 칵테일은 맥주의 대중적인 분위기와 칵테일의 우아한 느낌을 동시에 제공한다”며 “가벼운 저녁 파티에 제격”이라고 말했다.
김 강사가 맨 먼저 추천한 비어 칵테일은 ‘올 데이 롱(all day long).’ ‘종일 마셔도 질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레몬의 상큼한 맛과 맥주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불그스름한 셔벗 색의 칵테일. 2온스(소주 2잔 분량)의 멕시코산 맥주에 2온스의 레모네이드, 1온스의 보드카를 섞은 뒤 얼음 7, 8개를 넣고 믹서에 10초 정도 갈아 주면 된다. 멕시코 원주민이 쓰는 모자 솜브레로를 닮은 마가리타 글라스에 담으면 분위기가 더욱 살아난다.
‘프로드 목테일(fraud mocktail)’은 맛은 비알코올 음료같으나 마신 뒤에 취기가 온다. 그래서 ‘우먼 킬러’ ‘플레이보이 칵테일’이라고도 불린다. 500cc 맥주잔에 맥주(3온스)와 보드카(1과 2분의 1온스)에 크렘 드 망트(프랑스산 박하 리큐어) 2분의 1온스를 섞은 뒤 나머지 잔은 사이다로 채우면 근사한 에메랄드 빛 칵테일을 맛볼 수 있다.
폭탄주와 이름이 같은 ‘보일러 메이커’는 10온스의 맥주에 브랜디(5온스)와 아마레토(1온스·살구 맛이 나는 리큐어)를 넣으면 된다. 마치 보일러처럼 몸을 달아오르게 한다는 뜻이다. 이탈리아 요리와 궁합이 잘 맞는 ‘비어 부스타’나 아이리시 크림이 그림처럼 번지는 게 묘미인 ‘아이리시 비어’도 좋다.
포도주를 기본으로 한 ‘와인 칵테일’도 김 강사의 추천 종목. 차분한 와인 맛에 산뜻함을 더해 즐길 수 있다. 모나코 왕립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이에게 위로주로 건넸다는 ‘몬테카를로 임페리얼’, 파티에서 남은 와인을 모아 섞어 마신 데서 시작한 ‘와인 쿨러’, 북유럽의 추운 날씨에 버티기 위해 데워 마시는 ‘글뤼바인’이 대표적인 와인 칵테일이다.
 |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스타일 >
-

사설
구독
-

글로벌 현장을 가다
구독
-

정덕현의 그 영화 이 대사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푸드]프랑스 요리 메뉴 길어진다](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11/11/695801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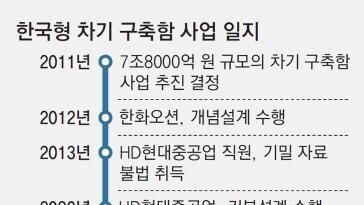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