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도 패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당장 동광무에서 내려가자고 우기고 있는데 갑자기 산 아래서 파수를 서던 군사 하나가 달려와 알렸다.
“제나라에서 급한 사자를 보내와 대왕을 뵙고자 합니다.”
“이리 데려오너라.”
줄곧 궁금하던 제나라 일이라 패왕은 두 번 생각해볼 것도 없이 사자를 불러들이게 했다. 오래잖아 한눈에 봐도 행색이 고단해 뵈는 제나라 사자가 패왕의 군막으로 이끌려 왔다. 사자는 패왕 앞에 엎드리자 눈물을 쏟으며 빌었다.
“대왕, 우리 제나라를 구해주소서. 지금 제나라의 군신(君臣)은 모두 고밀(高密)성에 갇혀 대왕의 구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 제나라는 과인의 10만 대군에게도 맞서 땅과 백성을 지켰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신의 몇만 잡병(雜兵)에게 그 꼴이 났느냐?”
패왕이 실로 알 수 없다는 듯 제나라 사자에게 그렇게 물었다. 사자가 눈물을 씻고 이를 갈며 대답했다.
“한왕이 역이기를 보내 우리 군왕을 속이고 있는 동안 평원(平原)나루를 건넌 한신이 역하(歷下)를 급습해 전해(田解) 장군과 화무상(華無傷)이 이끈 우리 20만 대군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쪽을 쪼개는 기세로 임치(臨淄)를 들이쳐 오니, 저희 군신(君臣)은 제대로 손 써볼 겨를조차 없이 그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왕(齊王) 전광(田廣)이 고밀성에 갇히게 된 경과를 상세히 전했다. 다 듣고 난 패왕은 자기 일처럼 화를 냈다.
“그 엉큼한 장돌뱅이놈이 또 더러운 잔꾀를 썼구나.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소리치고는 제나라 사자에게 다짐을 주듯 말했다.
“걱정하지 말라. 내 반드시 대군을 보내 제나라를 구하고 그대들 군신의 원한을 씻어줄 것이다!”
이어 장수들을 모두 군막으로 불러 모은 패왕은 그들 가운데서 용저(龍且)를 불러냈다.
“그대에게 5만 군사를 줄 터이니 고밀로 가서 제왕 전광을 구하도록 하라. 대량(大梁)과 산동을 지나면서 장정을 긁어모으면 20만 대군을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고밀에 이르면 한 싸움으로 한신을 사로잡고 그 더벅머리를 베어 와야 한다. 날을 길게 끌어서는 아니 된다.”
패왕이 그러면서 그날로 용저에게 5만 군사를 갈라주고 제나라를 구원하러 떠나보냈다.
용저가 이끌고 간 5만 군사는 동광무에 자리 잡은 초나라 군사의 절반에 가까웠다. 형양성을 지키는 군사들을 불러들이지 않고는 초군의 머릿수가 성고와 서광무에 펼쳐진 한군보다 너무 적었다. 아무리 패왕이라도 그걸로 험한 지세와 높은 성곽에 기대 지키기만 하는 한나라 대군을 함부로 들이칠 수는 없었다. 그 바람에 광무산에는 한동안 소강상태가 이어졌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게임 인더스트리
구독
-

고양이 눈
구독
-

후벼파는 한마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七.烏江의 슬픈 노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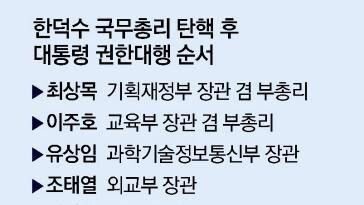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