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연구원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등 개화당 핵심인사를 제외한 갑신정변 적극 참여자 77명을 추적했다. 박 연구원은 특히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은 23명의 심문내용이 담긴 ‘추안급국안(推案及鞠案)’을 면밀히 분석했다.
이들 77명의 신분을 추적한 결과 양반 10명(13%), 중인 5명(6%), 상한 39명(51%), 미확인 23명(30%)으로 조사됐다. 미확인 인사들도 특정 신분을 내세우기 어려운 계층이므로 상한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상한의 비중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상한은 주로 군인, 겸종(양반집에서 심부름하던 평민), 상인, 내시, 궁녀 등의 직업을 지녔으며 정변 당시 중간지휘자, 정보원, 행동대원, 심부름꾼들의 역할을 했다. 추안급국안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역모’에 가담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면서도 적극 가담했다. 이들의 가담 사유가 많은 경우 입신출세에 있었지만 이를 고발할 경우에도 쉽게 출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힘든 길을 택했다. 이들 중에는 당시 최고 권신으로 친청파(親淸派)였던 민영익의 겸종도 있었다. 이들은 능력에 의한 인재 발탁과 개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담 이유를 진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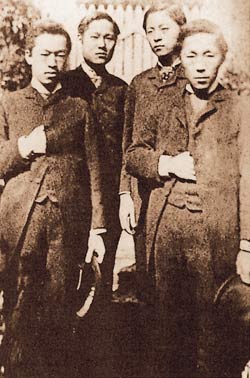
|
박 연구원은 갑신정변의 14개조 정령(政令)에는 이들 상한의 요구가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내시 가운데 재능 있는 자를 등용한다는 정령 4조, 전후좌우 4개 영으로 운영되던 친군(親軍·왕실친위군)을 정변 참여자가 가장 많았던 전영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 정령 11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들 참여자 가운데는 상한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변 직후 정3품의 고위직에 제수된 인사가 상당수였다.
이에 반해 중인층 참여자 5명 중 적극적 참여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경석은 그 이전에 숨졌고, 유대치는 정변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박 연구원은 또 이번 연구서에서 개화당이 거사 직후 전후좌우영의 병사 2000여 명에 대한 지휘권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영향 하에 있던 좌우영의 지휘자를 교체하지 않아 결국 청군 1500여 명의 공격에 무너졌다는 점을 새로 밝혔다.
 |
박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서 갑신정변에 대한 박사논문 한 편이 없었고 단행본도 2권뿐일 정도로 연구가 미진했다”며 “갑신정변이 근대적 부르주아 혁명이었느냐, 유교적 질서를 벗어나지 않으려 했던 문벌세력의 정권쟁탈전이었느냐는 성격 규정에 앞서 구체적 사실 확인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