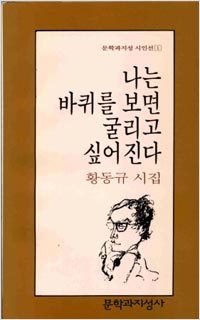
그런 점에서 황동규의 대표적인 시집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는 특별히 젊은 세대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시인은 이 시집을 통해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한 지식인의 현실 통찰과 그 극복의 지평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현실 그 이상의 차원을 지향한다. 젊은이라면 누구나 꿈꿀 권리를 갖고 있고, 이를 자기 스스로의 방식으로 현실화해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다. 그런데 이 시집은 인생에서 격정적인 한 시기를 보내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감성에서 지성에 이르는 한 통로를 예시해 보인다.
황동규의 시적 재능은 지성과 감성의 조화로운 결합,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것이 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나왔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낯설게 하기’지만, 드러난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응시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것은 실천 가능한, 변화된 인식의 촉구라고 규정할 만하다. 피상적으로 보면 황동규의 이 시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원초적 세계를 다룬 듯이 보이지만, 내재적으로는 지금 이곳에서의 힘겨운 생에 대한 육성을 길러 내고 있음을 어렵잖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시집은 1978년 유신정권의 말기 무렵 간행되었는데, 몇몇 정치시 외에도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함의를 떠나서 읽기는 어렵다. 시인은 당시 자신을 억누르는 상황과 여러 형태의 부자유에 대해 짐짓 달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이면에 엄정한 현실 인식을 숨겨 놓음으로써 모반을 꾀하고 있다.
‘나는 바퀴를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자전거 유모차 리어카의 바퀴/마차의 바퀴/굴러가는 바퀴도 굴리고 싶어진다’고 노래했을 때 이 천진함 속에서 어떤 절망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희원을 읽어 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바퀴는 그 모양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막 달려갈 듯이 역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인은 가만히 서 있는 바퀴도 보면 굴리고 싶어진다고 적는다. 심지어 구르고 있는 바퀴도 굴리고 싶다는데 이는 시적 기교의 하나로, 시인의 가열한 생의 의지와 천진난만한 기질을 엿볼 수 있다.
또 다른 시 ‘계엄령 속의 눈’의 일절은 다음과 같다.
‘아아 병든 말[언]이다/발바닥이 식었다/단순한 남자가 되려고 결심하다.’
생의 토양을 동토로 인식하는 시인은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지 애타게 묻고 있다. 그런데 오늘 이 물음은 아직도 유효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시집 속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황동규의 시 ‘불 끈 기차’도 들어 있다. 서울 신촌의 대학가에 살던 무렵, 철길을 보며 즐겨 읽던 이 시의 결구는 이렇다.
‘허지만 아빠,/기차는 수색에서 잘 꺼야/둥글게 맴돌다 꼬리에 코를 박고.’
정은숙 시인 마음산책 출판사 대표
21세기 신고전 50권 >
-

광화문에서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오늘도 건강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열아홉 살의 필독서 50권] 파인먼의 물리학 강의](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12/05/6959658.1.jpg)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7628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