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채도 서(西)광무에 비하면 못미덥기 짝이 없었다. 녹각과 목책을 두르고 다시 두꺼운 방벽과 든든한 보루를 쌓았다고는 하지만, 광무간의 벼랑이나 광무산 서록(西麓)의 가파른 비탈과는 견줄 바가 아니었다. 언제 패왕이 눈에 불을 켜고 뛰어들지 몰랐다.
그런데 방벽 안에서 버틴 지 엿새째인가 이레째가 되는 날이었다. 갑자기 초나라 진채가 웅성거리더니 다음 날이 되자 초나라 군사들이 차례로 진채를 버리고 남쪽으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번쾌가 달려와 말했다.
“적이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군사를 내어 뒤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 이는 필시 항왕이 우리 한군을 진채 밖으로 꾀어내려는 수작이다.”
한번 데어본 아이가 불을 두려워하듯 한왕이 그렇게 말하며 번쾌가 뒤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한왕을 찾아온 장량이 번쾌를 거들 듯 말했다.
“적은 우리를 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한왕이 알 수 없다는 듯 장량을 바라보며 물었다. 장량이 조심스레 말했다.
“그제 밤 우리 군사 한 갈래가 가만히 산을 내려가 고릉에 있는 적 후군을 들이치고 그 군량을 태워버렸습니다. 적은 당장 다음 끼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어찌 과인에게 말하지 않았소? 누가 그런 큰일을 했소?”
“오래 항왕 밑에 있어 초진(楚陣)의 정황을 잘 아는 옹치가 그 꾀를 냈고, 왕릉이 늘 이끌던 군사를 데리고 그대로 해냈습니다. 대왕께서 옹치를 못마땅히 여겨 허락하지 않으실까 아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옹치란 이름을 듣자 이맛살부터 찌푸린 한왕이 그 일은 더 따지지 않고 말머리를 돌렸다.
“과인이 여러 번 겪어보아 잘 알지만, 항왕은 병장기를 휘두르고 군사를 부리는 일만 싸움의 전부인지 아는 위인이오. 까짓 군량 좀 잃었다고 군사를 물릴 리가 없소이다. 틀림없이 우리 군사를 유인해 내려는 계책일 것이오.”
“항왕도 지난 일년 광무산에서 군량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도 군사를 내어 항왕을 급하게 뒤쫓는 일은 말리고 싶습니다. 섣불리 뒤쫓다가 항왕에게 다시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잠시 기다려 세력을 크게 모은 뒤에 뒤쫓아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마치 장량의 말을 뒷받침하려는 듯 탐마가 달려와 알렸다.
“동쪽에서 대군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붉은 깃발로 보아 우리 편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왕(齊王) 한신이 온 것이로구나. 과인이 몸소 나가 맞아야겠다.”
한왕이 반가운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장량을 돌아보며 이제 다 알았다는 듯 말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사설
구독
-

공기업 감동경영
구독
-

행복 나눔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七. 烏江의 슬픈 노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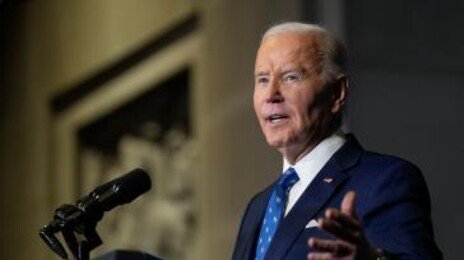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