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씨는 2004년 ‘오늘의작가상’ 수상작인 ‘공허의 4분의 1’에서 관리사무소 직원과 허드레 일꾼, 자폐증 소년 간의 공감대를 다뤄 좋은 평을 받았다. 최근 출간한 첫 창작집 ‘그녀의 나무 핑궈리’(민음사)에서 그는 30대 작가로는 드물게 우리 사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다. 노인, 중국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등이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이다. 그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쪽으로 끌리더라”며 “나 자신도 유복하게 살았던 쪽이 아니어서인지 그들의 인생이 잘 헤아려졌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작가는 직접 이들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관찰자를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나비’에서 주인공 여자의 삶은 고단하다. 남편을 잃은 뒤 어린 딸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도 녹록하지 않은데, 당뇨병 환자인 모친이 찾아와 같이 산다. 게다가 여자의 머릿속에 종양까지 자라고 있다. 이 여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딸의 눈을 통해서다. 딸은 엄마의 병을 ‘나비’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나비를 불러내기 위해 꽃을 그린다. 객관성을 유지하는 제3자의 눈은 역설적으로 여자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피로한 것인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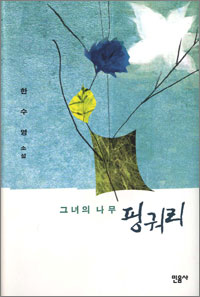 |
표제작 ‘그녀의 나무 핑궈리’에서도 한국 남자에게 시집 온 조선족 여성의 불운한 인생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은 집에서 키우는 개다. 조선족 만자 씨는 소박하면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남편은 불륜과 폭력을 일삼는다. 여성은 중국 옌볜에만 있는 핑궈리(사과와 배를 접목한 나무)를 떠올리면서 괴로움을 달랜다. 소설의 한 문장처럼 ‘사람이 살아가게 만드는 힘은 쇠붙이가 아니라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환상’인 것이다. 조선족 여성을 직접 만나 취재한 한 씨의 성실한 노력은 이렇듯 단단하고 차분한 문장에 스며 있다.
이 창작집에서 작가는 작고 낮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눈을 가지려고 한다. ‘나비’는 흰 눈 내리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눈은 모든 고통을 덮어주는 희망을 상징한다. ‘번지점프대에 오르다’에서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아픔과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의 고통을 겹쳐놓으면서, 길 너머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하는 것으로 맺는다. 소설에서 희망은 아직 추상적으로 그려진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시각을 갖고 싶다는 것이 작가의 바람이다. 한 씨는 “관심의 대상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늘진 사람들을 다루면서도 유머와 위트를 섞어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