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려오는 한군 기마대가 잘해야 1천 기(騎)를 크게 넘어 보이지 않자 패왕이 보검을 빼들고 앞서 달려가며 소리쳤다. 패왕을 따르는 8백 기도 이미 저마다 악에 받쳐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투지로 내달으니 한군은 그 기세에 놀라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달아나 버렸다.
“이제 됐다. 더는 적을 뒤쫓지 말고 배나 거두어들여라.”
추격해 오던 한군 기마대가 달아나는 걸 보고 패왕이 그렇게 소리쳐 군사를 거두었다. 하지만 구강(九江)의 군사들이 얼마나 모질게 인근 백성들을 닦달해 배를 치워 버렸는지 다시 한식경이나 더 회수(淮水) 가를 뒤져도 배다운 배는 나오지 않았다. 강 아래위 수십 리를 이 잡듯 훑어 찾아낸 것이 바닥이 뚫려 버려둔 듯한 거룻배 한 척과 쪽배 네댓 척뿐이었다.
급한 대로 거룻배를 고치니 그래도 사람과 말을 합쳐 여남은 기(騎)가 탈 수 있고, 쪽배도 한두 기는 나를 수 있어 곧 한꺼번에 스무 기는 물을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패왕은 군사를 갈라 물을 건너기 시작했다. 하지만 회수같이 큰물을 노질로 건너야 하다 보니 오가는 것이 너무 더뎠다. 배들이 겨우 다섯 번이나 회수 남북을 오고갔을까, 갑자기 함성과 함께 다시 한나라 기마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관영이 이끄는 본진으로, 한번 혼이 나봐서 그런지 5천 기가 한 덩어리가 되어 밀려들었다.
“겁내지 말라. 과인에게는 아직 보검과 오추마가 있다. 적이 백만이라도 두렵지 않다. 과인을 따르라!”
패왕이 다시 보검을 빼들고 앞장서며 그렇게 외쳤다. 어차피 회수를 등지고 있어 물러나 봤자 더 갈 곳이 없는 초나라 기병들이었다. 패왕의 외침에 따라 회수 북쪽에 남은 6백여 기가 한 덩어리가 되어 관영의 5천 기마대와 마주쳐갔다.
거의 열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으나 패왕을 앞세운 초군이 워낙 거세게 치고 드니 세력만 믿고 달려오던 한군은 금세 기가 꺾였다. 달려온 기세에 밀려 그대로 부딪치기는 해도 선두는 초군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대로 두면 한군 전체가 조각조각 나 차례로 쓸려버리고 말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가려 뽑은 낭중 기병 5천이 모두 온 데다 불같은 전투력을 자랑하는 맹장 관영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 처음에는 멈칫하며 밀렸으나 한군은 이내 전열을 가다듬고 열 배가 넘는 머릿수에 의지해 포위전을 펼치려 들었다. 초군을 두텁게 에워싼 뒤 여러 갈래 군사들을 차례로 내보내 천천히 그들의 기운을 빼고 세력을 지워가는 방식이었다.
그걸 알아본 패왕이 갑자기 칼을 들어 회수 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모두 물가로 물러나라. 적에게 에워싸여서는 아니 된다. 물을 등지고 반달 모양으로 진세를 벌여 배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 보자!”
그리고 자신은 뒤에 남아 한군의 급한 추격으로 초군의 전열이 무너지는 것을 막았다. 오래잖아 초나라 기마대는 작은 포구를 삼면으로 에워싸듯 반원진(半圓陣)을 쳤다. 그때 마침 회수 남쪽 나루에 인마를 부려놓고 온 작고 초라한 선단(船團)이 그 포구로 돌아왔다. 패왕은 반원진을 굳게 지키면서 20여 기를 골라 다시 남쪽 물가로 태워 보냈다.
글 이문열
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 >
-

오늘의 운세
구독
-

프리미엄뷰
구독
-

인터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소설]큰바람 불고 구름 일더니卷七. 烏江의 슬픈 노래](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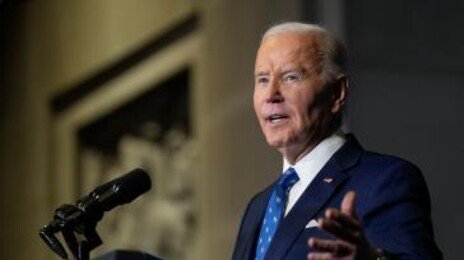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