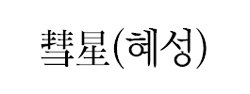

‘쓰는 비’의 모양을 생각하여 보자. ‘쓰는 비’는 빗자루와 머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 부분은 볏짚을 부드럽게 모아서 부채꼴로 만든다. 이 부채꼴이 혜성의 꼬리 부분과 유사하다.
이로 말미암아 ‘彗’는 ‘혜성’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추(추)’도 ‘쓰는 비’라는 뜻인데 이 글자에도 ‘혜성’이라는 뜻이 있다. 이와 같이 한자는, 자신이 나타내는 사물과 비슷한 모양의 다른 사물이 존재하면 그 다른 사물도 자신의 또 다른 의미로 갖는 현상이 있다.
비와 같은 털이나, 비와 유사한 모양을 나타내는 사물로 혜성을 나타내는 현상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tail’은 ‘꼬리’라는 뜻이지만 ‘혜성의 꼬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며, ‘comet’은 ‘혜성’이라는 뜻인데, 어원은 ‘머리카락’이다. ‘coma’도 ‘혜성의 꼬리 부분’을 나타내는데, ‘식물의 종발(種髮), 종모(種毛)’를 나타내기도 하며, 파인애플 등의 위 끝에 모인 잎사귀 모양을 나타내기도 한다. 종발이나 종모는 씨앗이 되는 털을 말한다.
이와 같이 동서양의 인류는 모두 ‘털’이나 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사물을 이용하여 살별, 즉 혜성을 나타낸다.
허성도 서울대 교수·중문학
-
- 좋아요
- 1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한자 이야기]蓋歸하여 反류而掩之하니 掩之가 誠是也면…](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2/03/29/45157002.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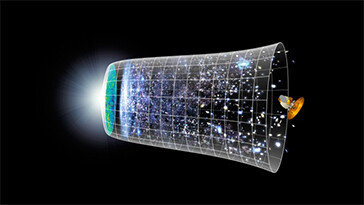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