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커피 문화의 메카이자 스타벅스 커피 체인점의 고향인 미국 시애틀. 이곳에 해가 지지 않는 컴퓨터 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우연일까? 아니면 아이디어와 혁신, 그리고 네트워킹은 커피의 각성효과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커피는 일찍이 사고의 명료함을 홍보했다. 그것은 이성의 시대를 대표하는 신비스러운 음료였다. 17세기 유럽의 사상가들은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음료를 마심으로써 고대 세계의 마법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커피하우스는 놀라운 정보의 원천이었으니, 뉴턴이 수학의 구슬로 우주를 꿰었던 기념비적 작품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칙’은 과학자들이 여기서 벌였던 중력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의 카페는 활기 넘치던 ‘선조 카페’와 비교하면 왠지 그 모습이 창백해 보인다. 그러나 커피는 여전히 사람들이 토론하고 아이디어와 정보를 교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벗으로 남았다. 카페인을 끼니 삼아 24시간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카페의 풍경은 아주 오래된 유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세계사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 주는 음료들의 이야기다.
과학 저술가인 저자는 맥주, 와인, 증류주, 커피, 차, 코카콜라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사를 흥건히 적셔 온 음료의 의미를 좇는다. 이들 음료에서 단순히 알코올과 카페인 이상의 인문학적 성분, 역사의 향과 맛을 우려낸다.
저자는 이 6가지 음료가 역사의 전환기마다 전면에 모습을 나타냈으며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촉매와도 같았다”고 말한다.
기원전 1만 년경 마지막 빙하시대가 끝나갈 무렵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맥주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인들에게 일용할 식량이자 급여였고 또한 화폐였다. 고대 도시국가들의 황금시대를 수놓았던 와인은 그리스가 주도했던 해상무역의 주요 수출품이었다. 브랜디나 럼,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유럽이 신대륙 발견에 나섰던 때에 선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 주었다. 럼은 노예들에게 노동의 고통을 희석시키는 마약으로 주입되었다.
또한 동방에서 유래한 차의 매혹은 유럽의 침탈을 불렀으니 “영국의 멋쟁이들이 좋아했던 붉은 홍차 한 잔엔 제국주의의 무서운 흉계가 녹아 있었다.”
코카콜라는 20세기의 음료다. 인류가 소비하는 음료의 3%를 차지하는 강력한 글로벌 브랜드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코카콜라의 갈색 거품은 미국의 전진, 세계화의 성장을 견인하며 지금도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다.
원제 ‘A History of The World in Six Glasses’(2005년).
이기우 문화전문기자 keywoo@donga.com
인문사회 >
-

사설
구독
-

유레카 모멘트
구독
-

2030세상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책의 향기]“콩나물 팍팍 무쳤냐”… 국민 울고 웃긴 예능史](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98.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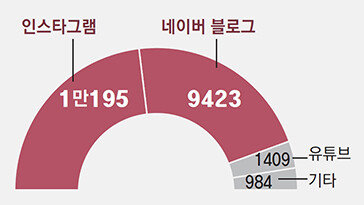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