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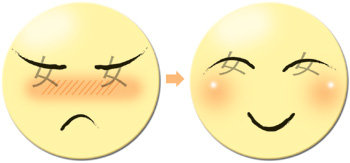
○ 친구처럼 자매처럼, 시누이 올케
둘째 며느리 이모(39·주부·서울 서초구 잠원동) 씨는 몇 년 전 큰 시누이가 보여 주었던 속 깊은 행동만 생각하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의 거취를 놓고 2남 2녀가 모여 고민하고 있을 때 요양원에 모시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큰 시누이였기 때문.
이 씨는 “며느리들은 물론 두 아들조차 아버님을 남에게 맡기자는 말을 감히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형님이 먼저 나서준 것이 솔직히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며느리들이 병든 시아버지를 남에게 맡기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며 요양원 입소에 필요한 잡다한 뒷일까지 도맡아 하는 것을 보곤 큰 마음 씀씀이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고 전했다.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시누이도 진정한 나의 가족이란 걸 그때야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는 것.
이 씨의 시누이처럼 집안 대소사에 적극적으로 나서 화목을 도맡는 ‘여장부 시누이’ 들이 많아졌다.
주부 김경애(47·서울 종로구 내수동) 씨는 “네 살 아래 시누이가 있는데, 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어머니 편을 들기보다 며느리인 내 처지에서 시어머니를 이해시키려 노력해 줘 그 흔한 갈등을 거의 겪지 않았다”면서 “이런 시누이를 둔 덕으로 나도 친정에 가면 욕먹지 않는 시누이, 괜찮은 시누이가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는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가족 문제보다 사회참여 등 개인 발전에 더 관심이 많아지면서 예전 같은 시누이 올케 간 갈등구조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지위가 오로지 남편의 지위에 따라서만 결정되던 시대에는 외부에서 가족으로 편입된 올케에게 시누이가 경쟁의식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요새 여자들은 스스로 경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 우리는 한 팀, 동서 사이
동서들끼리 생일잔치를 돌아가며 해 줄 정도로 우애가 유별난 이선희(49·서울 양천구 목동) 씨. 이들도 처음부터 각별했던 것은 아니었다. 나이도 고만고만한 데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견제와 시샘도 있었지만 얼마 전 맏동서인 이 씨의 집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서 형제애가 두터워졌다.
이 씨는 “그 어려운 빚보증까지 서 주었던 시동생과 동서들을 보면서 힘든 세상살이에 그래도 믿을 건 부모 형제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절감했다”고 말했다.
요즘 젊은층에는 외며느리도 많다 보니 동서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기도 한다. 한때 시어머니의 편애로 손위 동서와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주부 정모(38·서울 도봉구 창동) 씨는 “요즘 직장 후배들을 보니 외며느리가 많아 시댁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혼자 다 짊어지고 있더라”며 “미우나 고우나 의무를 분담할 수 있는 큰동서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변화된 동서 관계 역시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다.
천리안 ‘주부동호회’를 이끌고 있는 박수희 씨는 “어느 집이나 다들 각자 독특한 사정은 있겠지만 요즘 주부들은 동서, 시누이를 포함한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기 계발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말했다.
박완정 사외기자 tyra21@naver.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