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는 지옥처럼 검고, 죽음처럼 강하며, 사랑처럼 달콤하다.’
독일을 무대로 펼쳐지는 이 스릴러 소설은 이런 터키 속담을 모티브로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자극적이다.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두고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의 대형 커피체인점에서 커피를 마신 수백 명이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에 실려 간다. 카페인을 치사량 조금 못 미치게 농축한 독극물을 누군가 커피 봉지 안에 주입한 것. 대상 커피업체는 점차 확대되고 독일 전역이 공포에 휩싸이며 커피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기피 식품이 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커피를 못 마시게 하는 걸까.
주인공은 커피를 질색하는 TV방송 수습 여기자와 커피광인 로스터(커피콩을 볶거나 배합해 판매하는 전문소매상). 우연히 이 사건에 말려든 이들은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면서 문화·종교·정치·경제가 뒤섞인 거대한 음모의 퍼즐을 맞춰 간다.
용의 선상에 오른 단체들은 교묘하고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 연결고리는 ‘커피가 사회경제의 발전 속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가상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커피 향기가 계몽과 혁명을 낳았다는 그럴듯한 가설을 펼친다. 서구 문명이 아랍 문명을 앞지른 것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공략하던 오스만제국의 군대가 남기고 간 커피가 유럽에 도입된 1683년 전후다. 그전까지 서유럽의 주된 음료는 와인과 맥주였다. 알코올이 사회적 억압에 대한 좌절감을 몽롱하게 만드는 마취제라면, 커피는 그런 모순을 또렷이 인식하게 하는 각성제다.
이는 서양혁명의 요람이 커피하우스라는 사실과 연결된다. 미국헌법이 탄생한 곳은 머천트 커피하우스였고, 프랑스혁명 당시 바스티유 습격사건을 촉발한 연설은 카페 드 푸아에서 이뤄졌다. 미국혁명을 발화시킨 보스턴차사건을 전후해 미국은 차의 대체품으로서 커피의 최대 수입국이 됐으며, 1780년 이미 800여 곳의 카페가 성업 중이었던 파리에선 혁명의 향기가 진동했다. 반면 1850년까지 커피보다 독주 소비량이 월등히 많았던 독일은 혁명에 둔감했다.
이 논문은 3개의 용의단체와 연결된다. 그중 하나는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을 지닌 현대인에게 여유를 돌려줘야 한다는 모토를 지닌 ‘시간 늦추기 협회’다. 시간 늦추기와 커피가 무슨 함수관계란 말인가. 커피는 편안한 수면을 몰아내고 쉬지 않고 일하게 한다는 점에서 ‘느림의 철학’을 방해하는 존재다.
또 다른 용의단체는 아랍계를 대주주로 둔 상업은행. 여기에는 이슬람문명이 서구에 전파했던 ‘신의 식물(아프리카어로 카와)’ 또는 ‘악마의 열매(아랍어로 카베)’를 회수함으로써 새로운 문명의 역전을 꾀한다는 음모론이 개입한다. 서양문명에서 커피를 없애는 것은 곧 ‘정신의 원유’를 탈취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사회보장의 축소를 골자로 한 대개혁법안을 추진한 독일의 재계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심을 억누르기 위해 커피 섭취를 의도적으로 차단한다는 것. 이 대목은 2003년 12월 실제 독일의회를 통과한 노동개혁법안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현실감을 더해 준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시나리오 작가인 저자는 박진감 넘치는 9일간의 추리기행을 펼치면서 범인이 누구일까 하는 독자의 호기심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끌고 가는 솜씨를 발휘한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문학예술 >
-

사설
구독
-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
구독
-

청계천 옆 사진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책의 향기]평창 온 괴짜 할배 “이 아름다운 나라에 핵폭탄을?”](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18/02/10/88603478.1.jpg)
![“대통령을 뽑았더니 영부남?” 활동 중단 김여사의 향후 행보는? [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76280.1.thumb.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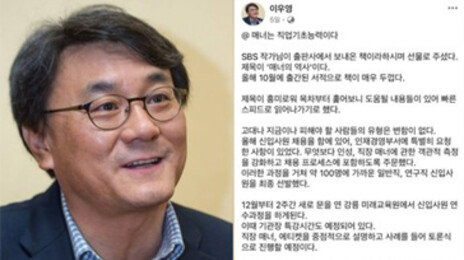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