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생각을 하면 오산이다. 대부분이 누군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밥상에 익숙해져 있다. 싱글의 밥상은 대부분 ‘조용한 밥상’이다. 웃음도 대화도 없다. 자신이 밥알을 씹는 소리가 시끄러울 지경이다. 배달 음식으로 한 끼를 때우고 싶어도 ‘2인분 이상이어야 배달한다’는 대답을 듣기 일쑤다. 식당에 혼자 가면 종업원의 표정에서 ‘손님이 많은데 혼자 테이블 차지하겠다고?’라는 말을 읽게 된다.
식당 안 사람들이 혼자 밥을 먹는 나를 힐끔대고 있다는 착각까지 든다. 귀찮아서 아예 굶기도 한다. “그냥 대충 때우지 뭐…”라며 휴일을 보낸 적도 있다.
따지고 보면, 어디 밥 먹는 것뿐이던가?
싱글은 혼자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 작게는 침대를 어느 방향으로 놓을지에 대한 결정에서부터 크게는 어느 곳에 어떤 집을 얻느냐는 선택과 미래의 자신을 위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가구를 재배치할 때는 마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낭패감에 사로잡힌다. 부랴부랴 시간에 쫓겨 외출하면서 빈집에 올 택배 물품을 걱정할 때도 있다. 평일 낮에만 하는 가스 점검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나 자신의 마음의 문제였다.
어느 날 문득 나가서 밥을 사 먹는 것도 지겨워 내 손으로 갓 지은 쌀밥에 얼큰한 김치찌개로 식탁을 차렸다. 만족감이 밀려왔다.
나만을 위해 내 힘으로 차린 밥상이 주는 기쁨. 도저히 혼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았던 조용한 밥상이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닌 ‘나만을 위한 밥상’이란 생각에 즐거워진 것이다.
혼자 살기는 자신의 정신세계에서 독립을 이루어내야만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당당해지고 조금은 도도하다 싶을 만큼 자신감이 넘쳐날 때 ‘혼자 먹는 밥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밥상’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된다. 결국 ‘싱글 라이프’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법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황명화 자유기고가
30대 공간 >
-

송평인 칼럼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기고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30대 공간]한방차 전문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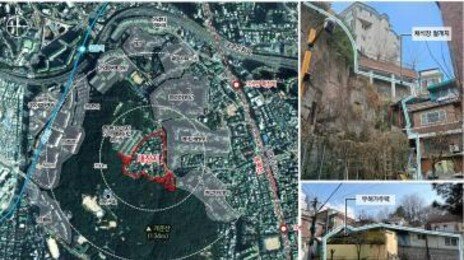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