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술은 문제 상황을 주로 다룬다. 특히 현대 문명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즐겨 묻는다. 성찰의 수준에 따라 해법의 깊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직 인생 경험이 짧은 학생들에게 시대의 처방전은 언제나 부담스럽다. 진행 과정을 몸소 겪지 못했으니 공감 능력도 부족하다. 배워서 외운 개념만으로는 해결책이 쉬이 떠오를 리 없다. 숨어 있는 비교 대상을 함께 이해하면 문제 상황도 한층 뚜렷해진다.
이 책은 아메리칸인디언(알곤킨 어족)들의 문화를 통해 사라져 가는 전통의 지혜를 다시 들추어낸다. ‘시계’는 기계적 리듬과 비생태적 문화를 대표한다. 인디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없다. 이 책은 그들의 삶을 그리는 조용한 다큐멘터리지만, 읽다 보면 우리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한다. 명상처럼 내 속의 무언가가 새로워지는 또 다른 느낌도 만날 수 있다.
먼저 시간이 없는 대화는 어떤 식일지 궁금하다. 알곤킨인에게는 숫자로 표현된 달력이 없다. ‘배고픈 달이 뜰 때’ ‘물고기가 보금자리를 찾을 때’ ‘크랜베리 열매가 열릴 때 뜨는 달’로 달(月)을 표현한다. 시간은 그 자체로 독립되지 않고, 살며 얻는 경험과 섞인다.
약속시간은 어떻게 정할까. ‘해가 저 나무들 위에 걸릴 때’이다. 노인의 나이도 마찬가지다. “겨울눈을 몇 번이나 밟아보셨나요?” 문득 계절의 순환을 잊고 기계 시간 속에 사는 우리를 돌아본다. 시계는 감정도 없고 지치지도 않잖는가.
알곤킨 사람들의 언어는 너무나도 문학적이다. “나는 오늘 어둠 속에 있답니다.” “나는 태양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이에요.” 감정표현이 이 정도다. 창문은 ‘바깥과 안쪽에 동시에 있는 것’이고, 연인은 ‘나의 새’이다. 일상 언어가 곧 시(詩)의 경지라니! 그 신선함에 마음이 뜨끔하다.
생명을 존중하는 감각에는 사회적 약자란 없다. “아이쿠 정말 늙으셨군요.” 백발의 노인에게 그동안 버텨낸 ‘배고픈 달’(추운 2월)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어제는 ‘이미 잤던 날’이고, 내일은 ‘아직 깨지 않은 날’이다. 개방적이고 맑은 영혼을 가진 어린 아이들의 말투를 닮고 싶은 흔적들이다.
자연의 리듬과 박자는 전체성의 통찰로 이어진다. 땅은 약초를 생산하는 어머니이고, 동물은 삶의 원초성을 공유하는 인간의 이웃이다. ‘모두가 나의 형제’라 여기는 삶의 방식은 우주 전체로 풀어 쓰는 거대한 철학이기도 하다.
어쩌면 새로운 것들이란 잃어버린 것들일지도 모른다. 인류가 흘려버린 알곡들을 다시 되새김해 보자. 구술에서 왜 그토록 현대 문명에 집착하는지 그 마음을 공감하게 될 것이다.
권희정 상명대부속여고 철학·논술 교사
사이버 포커스 >
-

사설
구독 785
-

횡설수설
구독
-

오늘의 운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이버 포커스]내실있는 ISP 사업자 '팬월드네트웍스'](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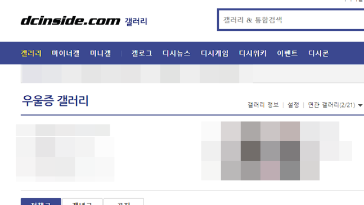

![[김순덕 칼럼]남편을 왕으로 만든 여자, ‘원경’과 김 여사](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067144.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