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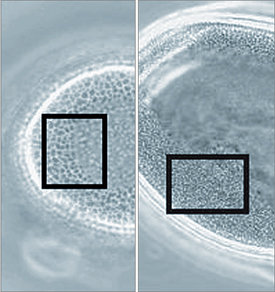
■ 씨앗-꽃가루도 유물… 고고학계 ‘식물고고학’ 관심 고조
전문가들은 식물고고학이야말로 기존 고고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농경의 기원과 경작 방식의 변화,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기후와 생태계 모습까지 실증해 낼 열쇠라고 입을 모은다.
○전남 무안 습지식물 씨앗, 2000년 전도 논농사 방증
식물고고학은 종자, 뿌리 같은 식물 유체 연구와 꽃가루 연구로 나뉜다. 전자가 주로 인간의 경제, 문화를 밝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면 후자는 시대별 기후와 생태계 변화를 재구성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그간의 연구는 벼농사의 기원을 밝히는 데 한정돼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식물 종자의 형태와 크기를 분류하고 통계화해 인간이 어떻게 야생식물을 이용했고 작물로 변화시켰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전남 무안군 양장리 유적에서 출토된 것은 볍씨만이 아니었다. 무수한 잡초 종자가 함께 나왔다.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박태식 연구관이 분석해 보니 모두 습지식물이었다. 이는 2000년 전에도 화전이나 밭이 아니라 논에 물을 대 벼농사를 지었다는 결정적 증거다. 그는 현재 식물과 비교해 기후와 식생이 2000년간 크게 변하지 않은 것까지 확인했다.
경남 진주시 남강댐 수몰지구 유적에서는 쌀 밀 보리 콩 팥 들깨의 탄화 씨앗이 나왔다. 이처럼 다작물을 경작하려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게 이경아 서울대 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3500년 전인 청동기 전기에 이미 농경사회가 정착됐다는 의미다.
그가 참여한 중국 허난 성, 산둥 성 유적 연구는 신석기 후기부터 하왕조 시대의 사회상까지 밝혀냈다. 쌀은 지배층 주거지에만 있었고 머루류와 함께 발효된 흔적으로 발견됐다. 이는 쌀이 서민의 주식보다는 지배계급이 선호한 고급술의 원료로 사용됐음을 보여 준다.
○전북 익산 꽃가루-삼국사기 ‘미륵사 홍수’ 증명
그는 퇴적층별 꽃가루를 연속적으로 연구해 한반도 남부가 1만2000년 전에서 8000년 전까지 추운 기후인 아한대 식생을 보이다가 8000년 전부터 급격히 따뜻해져 4000년 전에는 벼농사에 적합한 기후였다는 것까지 밝혀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식물 종자와 꽃가루는 대부분 그냥 버려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안승모 원광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는 “고고학 발전을 위해서라도 식물고고학 전문 연구기관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