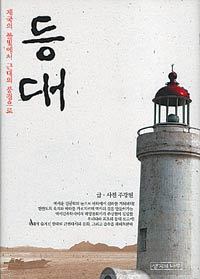
월미도에도 부도에도, 우도 호미곶 마라도에도 있다. 등대다. 등대 하면 낭만 고독 멜랑콜리란 단어가 떠오른다. 저자는 물론 등대에 이런 요소가 있음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등대를 낭만의 전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등대는 일제강점기 ‘제국’의 배를 인도하기 위해 세워졌고 근현대사의 질곡을 지나오면서 오늘날 ‘항로표지원’의 희로애락이 넘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항로표지원들은 ‘애잔한 취향’이 느껴지는 ‘등대지기’란 표현을 싫어한다고 전한다.
이 책은 근대 건축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근대문화유산인 등대에 관한 종합보고서다. 역사민속학자이자 해양문화사가인 저자가 전국의 등대를 일일이 답사해 등대 40곳의 역사와 삶을 소개했다. 일제강점기 때의 관보와 신문기사 중 등대 관련 사료를 샅샅이 조사한 열정이 페이지마다 묻어난다. 저자가 직접 찍은 등대 사진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런 등대가 있었다니’ 하는 탄성이 절로 나온다.
어떤 등대 하나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여수항을 벗어나 외해로 접어들면 나타나는 연도의 소리도등대는 백색의 육각형 등탑 위에 원형의 등롱(燈籠)을 올렸다. 처마에 겹으로 주름을 넣어 아름다움이 지극하다. 출입문의 박공과 열주는 그리스 신전 양식을 본떴다.
등대에 대한 저자의 애정은 등대 특유의 장중한 공간미와 시간의 흔적을 무시한 채 개조되고 있는 등대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나타난다. 구조조정 명목으로 유인 등대를 무인화하는 것에는 “절집에 스님이 있어야 절집 살림에 윤이 나듯 등대에 등대원이 있어야 등대 살림에 온기가 돌고 빛이 밝아지는 법”이라고 일갈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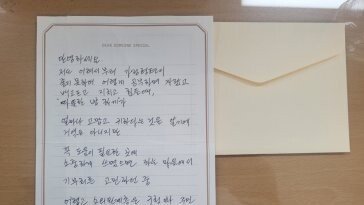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