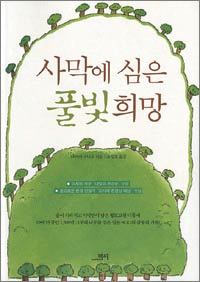
매년 봄이면 한반도 전역을 괴롭히는 황사. 중국의 숲 파괴로 인한 사막화 때문이란 건 알겠다. 그러나 매번 짜증을 내면서도 사막화된 지역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호소는 한 귀로 흘려 들은 것도 사실이다. 인간이 생태계의 어떤 그물망에 생채기를 냈기에 황사가 심각해졌는지는 모른다. 알도 레오폴드는 이 같은 태도를 ‘생태적 장님’이라고 불렀다.
이 책은 수많은 ‘생태적 장님’에게 그간의 무지를 반성하게 하는 ‘울림’을 준다. 일본의 한 환경운동가가 10여 년 동안 중국의 황토고원 다퉁(大同) 지역에 무려 1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 많은 나무를 심은 녹화사업의 과정을 담담히 적었다. 다퉁은 가속화된 사막화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이 줄어 식수난에 시달리는 곳이다.
저자는 석탄 매연으로 눈이 슴벅거리고 사방이 온통 황토색인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본 놈”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런 고생이 한두 가지가 아님에도 그 체험을 적은 글은 어찌 그리 쾌활하고 낙관적인지. 그래서 더 감동적이다.
이 책은 또 국제연대에 대한 추상적 생각과 숲에 대한 전문성 없이 무작정 뛰어든 환경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도 전해 준다. 저자의 녹화 프로젝트는 초창기 1년이 지나도 제자리를 잡은 묘목이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실패했다. 숲 전문가는 “비정부기구(NGO)라고는 하지만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이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군요. 많은 물이 필요한 포플러 나무를 건조지역에 심으면 어쩌자는 겁니까”라고 말한다.
한 환경운동가의 담담한 일기는 생태적 장님과 무모한 환경단체들 모두 읽어 봐야 할 환경보고서이자 환경운동 지침서가 됐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동주의 여행이야기 >
-

M-Tech와 함께 안전운전
구독
-

김지현의 정치언락
구독
-

특파원 칼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김동주의 여행이야기]태국 매홍손 '카렌족의 여인'](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3/10/21/6905771.1.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