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사람들 참 눈물이 많았나 보다. 장례길, 유배길, 상소길, 휴가길, 과거길, 암행어사길 등 조선시대 후반의 특수기행문들을 전문연구자들이 풀어낸 이 책을 읽노라면 웬 사내들이 그리 눈물이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시골집을 마련해 병약한 아내와 오순도순 살려했건만 이사하는 날이 아내의 장례길이 된 선비 신노숭은 불혹의 나이임에도 가슴 먹먹한 슬픔을 토로함에 부끄러움이 없다. 오랜 병치레 끝에 “공연히 서방님 잠 깨우지 마시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난 아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끊임없는 눈물의 씨앗이다. 아내가 죽은 뒤 잠을 이루지 못해 머리맡에서 지은 시문을 모았다 해서 ‘침상집(枕上集)’, 고생하는 아내의 눈썹을 펴주지 못한 한탄을 담았다 해서 ‘미안기(眉眼記)’ 같은 시문을 짓고 또 짓는다. 울다 지쳐서는 모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어찌 눈물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위에 있는 눈으로 나오는가에 대한 글을 남길 정도다.
19세기 말 압록강을 건너 청나라 땅을 염탐하는 임무를 받은 3명의 조선군 장교는 낯선 땅에서 고생길이 힘들어 울먹이고 혹시나 마적 떼를 만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운다. 명색이 군인으로 기골이 장대한 사내들이건만 웬 겁이 그리 많은지 빗길에 앉아 신세타령을 하거나 떼로 눈물 흘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서원철폐령의 부당함을 상소하기 위해 고향 안동에서 서울로 올라온 영남 남인선비들은 또 어떤가. 여비는 떨어져 가는데 정권을 잡은 서인들의 박대에 일이 엉클어지자 숙소로 돌아오는 빗길에 눈물이 앞을 가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울고 만다.
눈물이 많은 만큼 소심한 면모도 많다. 영조시절 정7품 하급관리였던 황윤석은 고향에 처자를 두고 서울에서 하숙하며 박봉과 격무의 연속인 관직생활을 하다 휴가를 떠나면서도 혹시 윗분들이 찾을까 노심초사한다. 광해군 때 지방관 이유간은 공무보다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객을 접대하는 업무에 지친다.
소심한 이가 많다 보니 일처리가 어설픈 경우도 허다했다. 첩보업무를 펼친다고 월경한 장교들은 결국 신분을 다 노출하고 거꾸로 조선의 정보를 청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순조 때 암행어사 박내겸은 자신을 가장한 가짜 어사의 출몰 때문에 오히려 불심검문에 걸려 마패를 보여 주며 미리 신분을 노출하는 어이없는 일을 빚는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눈물 많고 정 많고 어수룩한 우리네 조상들을 만날 수 있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펼치지만 늘 시스템의 문제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라는 시스템의 힘을 절감하게 해 주는 책이기도 하다. 섬세한 미시사를 다채롭게 요리해 낸 글만큼이나 운치가 넘치는 풍부한 도판자료도 이 책의 빼놓을 수 없는 미덕이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레포츠]낚시](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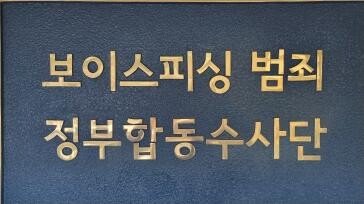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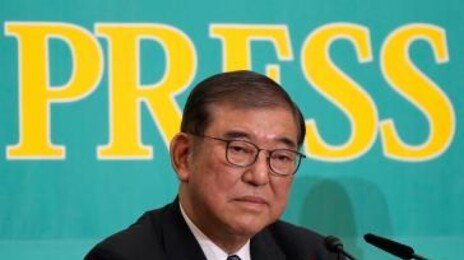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