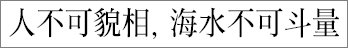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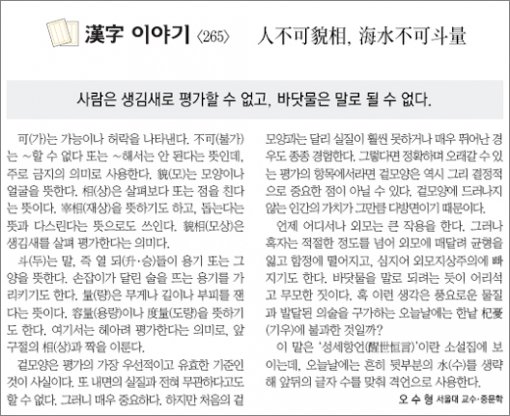
可(가)는 가능이나 허락을 나타낸다. 不可(불가)는 ∼할 수 없다 또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주로 금지의 의미로 사용한다. 貌(모)는 모양이나 얼굴을 뜻한다. 相(상)은 살펴보다 또는 점을 친다는 뜻이다. 宰相(재상)을 뜻하기도 하고, 돕는다는 뜻과 다스린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貌相(모상)은 생김새를 살펴 평가한다는 의미다.
斗(두)는 말, 즉 열 되(升·승)들이 용기 또는 그 양을 뜻한다. 손잡이가 달린 술을 뜨는 용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量(량)은 무게나 길이나 부피를 잰다는 뜻이다. 容量(용량)이나 度量(도량)을 뜻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헤아려 평가한다는 의미로, 앞 구절의 相(상)과 짝을 이룬다.
겉모양은 평가의 가장 우선적이고 유효한 기준인 것이 사실이다. 또 내면의 실질과 전혀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처음의 겉모양과는 달리 실질이 훨씬 못하거나 매우 뛰어난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그렇다면 정확하며 오래갈 수 있는 평가의 항목에서라면 겉모양은 역시 그리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있다. 겉모양에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가치가 그만큼 다방면이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외모는 큰 작용을 한다. 그러나 혹자는 적절한 정도를 넘어 외모에 매달려 균형을 잃고 함정에 떨어지고, 심지어 외모지상주의에 빠지기도 한다. 바닷물을 말로 되려는 듯이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다. 혹 이런 생각은 풍요로운 물질과 발달된 의술을 구가하는 오늘날에는 한낱 杞憂(기우)에 불과한 것일까?
이 말은 ‘성세항언(醒世恒言)’이란 소설집에 보이는데, 오늘날에는 흔히 뒷부분의 水(수)를 생략해 앞뒤의 글자 수를 맞춰 격언으로 사용한다.
오수형 서울대 교수·중문학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성매매 신종 업태 >
-

월요 초대석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김영민의 본다는 것은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기업 사활 걸린 상법 개정인데… ‘표’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野[광화문에서/김지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8500.1.thumb.jpg)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