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존주의의 향취가 물씬한 이 편지글의 발신자는 누구일까. 놀랍게도 늘 차분한 목소리로 심오한 철학의 세계를 안내해 온 박이문(77) 연세대 특임교수다. 수신자는 카뮈의 스승이자 ‘섬’ ‘어느 개의 죽음’ 등의 미문(美文)으로 이름 높은 장 그르니에(1898∼1971).
박 교수는 1961년 이화여대 불문학과 교수 자리를 박차고 프랑스 소르본대로 유학을 떠났다. 이미 서울대에서 보들레르로 불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는 거기서 다시 말라르메로 박사학위를 받고도 지적 허기를 달래지 못해 다시 철학공부를 시작했다. 그때 미학과 교수였던 그르니에의 수업을 들었던 그는 1967년 미국 남캘리포니아대로 다시 유학을 떠나며 비장한 심경이 담긴 프랑스어 편지를 보냈다.
그르니에는 이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 앙드레 지드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창간한 프랑스 문학월간지 ‘누벨 르뷰 프랑세즈’ 1967년 6월호에 이를 게재했다. 이 잡지에 실린 첫 한국인의 글이었을 이 글이 40년 만에 우리말로 번역돼 다음 주 출간될 계간 ‘비평’에 전재된다. 또 이번 주 출간된 박 교수의 산문집 ‘철학의 눈’(미다스북스)에도 실렸다.
박 교수는 이 글에서 “나의 탄생은 굴욕이다. 왜냐하면 난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계속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도저한 자기부정의식을 펼친다. 그것은 식민통치와 독립운동, 분단과 이념갈등 그리고 전쟁과 가난으로 점철된 제3세계 지식인이 서양에서 목도한 이성의 위력에 대한 경탄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그는 “한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던” 서양의 선생님들이 “그저 적은 지식을 팔아먹고 있는 무식한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심지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가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는 표현은 자신의 이상적 모델이었던 사르트르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처럼 견고한 이성의 갑옷을 입은 그들도 궁극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없는 “사색하는 불쌍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 그것은 앎에 대한 그의 순례의 끝이 아니었다. 서양에서 찾은 연약하지만 뜨거운 이성의 촛불에 의지해 다시 암흑 속을 헤치고 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어진다.
“지금 읽어 보면 낯 뜨겁지만 그만큼 진지하기도 했습니다. 소르본에서 철학공부를 할 때만큼 미친 듯 공부한 적이 없었고 그만큼 행복한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로 상담을 위해 한 차례 만났던 그르니에에게 내 그런 진실이 통했던 것이겠지요. 요즘 젊은이들과도 그 진실의 일단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노(老)철학자는 꽃같이 붉은 미소를 머금었다.
권재현 기자 confetti@donga.com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성매매 신종 업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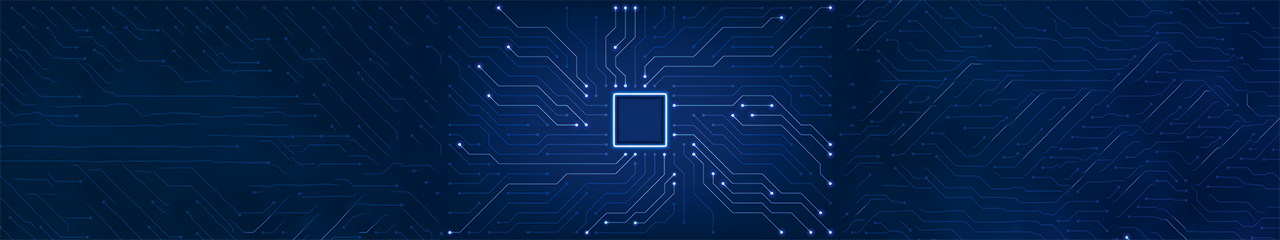
이럴땐 이렇게!
구독
-

2030세상
구독
-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