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선옥(44·사진) 씨의 소설은 이제 낯설게도 보인다. 역사 속의 비장한 인물이거나 상큼 발랄한 도시 남녀가 나오지 않는 얘기는 ‘요즘 소설’ 같지 않다. 등을 구부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오래 눈을 맞춰 온 작가. 독자들에게 빠르게 잊혀져 갈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는 것을 공선옥 씨는 일깨워준다.
새 소설집 ‘명랑한 밤길’에서 작가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고통과 소외 의식을 신랄하게 전달하는 데만 머물지 않는다. 작가의 글쓰기는 따뜻해졌다. ‘2006년 작가가 선정한 올해의 좋은 소설’로 선정된 표제작 ‘명랑한 밤길’을 봐도 그렇다. 주인공은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는 스물한 살 간호조무사 처녀. 오빠 둘은 신용불량자이고 이혼한 언니는 직장에 다니면서 아들을 키워야 하는지라 어머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화자뿐이다. 어느 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응급환자로 병원에 실려 왔던 잘 생긴 사내가 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외국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자상하게 여자에게 말을 걸고 안아 주는 남자. 혼자 있는 어머니는 생각도 못하고 밤마다 남자의 집에 가서는, 남자가 들려주는 외국 가수들의 이름을 외우고자 애쓰는 여자의 모습은, 들뜬 심정이 이해되는 한편 애처롭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는 유머러스한 상황을 끼워 넣어 독자가 웃음을 터뜨리게 한다. 쓸쓸한 인물의 처지는 독자에게 외려 외면받기 쉬운데, 작가는 생기 있는 유머를 통해 독자를 작품에 몰입시킨다. ‘그의 머리에서는 나로서는 처음 맡는 샴푸 냄새가 났다. (…)그 샴푸 냄새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용기가 없어서 나는 그만, 샴푸 이름을 묻고 말았다. 그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불쑥 말했다. “떠 블 리 찌 샴푸.”’
‘선수’ 남자와 ‘초짜’ 여자의 연애는 물론 비극으로 끝난다. 여자를 잠시 행복하게 했던 연애는, 곧 여자의 처지가 얼마나 빈한한 것인지를 일깨우는 계기가 돼 버린다. 그런데 작가는 쓸쓸하게 밤길을 걷는 여성이, 소주잔을 부딪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눈을 돌리게 한다.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날이지만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노동자들. 작가는 막 사랑에 실패한 여자에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독자들에게 ‘캄캄한 밤길이지만 명랑한 발걸음’을 걷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명랑한 밤길’뿐 아니다. 단편 ‘아무도 모르는 가을’에서 인자는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셋집에서도 쫓겨나고, ‘도넛과 토마토’에서 문희는 남편의 부도와 이혼으로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살아야 한다. 공선옥 씨의 예전 소설에서 그랬듯, 여성들의 삶은 신산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작가는 희망을 얹어 놓는다. 문희는 병으로 죽어가는 전 남편의 필리핀인 아내에게 손을 내밀고, 인자는 가정을 잃고 혼자 된 남자가 내미는 손을 잡는다. 공 씨는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어우러짐에서 희망을 찾아 낸다.
“나는 다만 그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바람 부는 길가에서나마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하면서 다른 누구도 아닌 그들만의 작고 고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하는 작가. 상처와 아픔을 명랑하고 생기 있게 이겨 나가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그 소망을 이뤄 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스타일 >
-

박중현 칼럼
구독
-

딥다이브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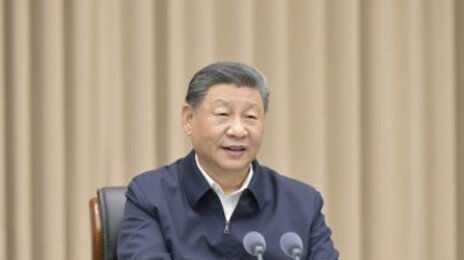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