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꼭 사전같이 생긴 이 책의 두께에 당황하지 말 것. 1991년부터 시작(詩作) 메모, 일기, 독서노트를 모은 것이라니 17년의 시간이 쌓여 있다. 처음부터 집중해서, 꼼꼼하게 따라 읽어야 하는 소설이나 이론서가 아니라, 아무 데나 펼쳐 읽어도 좋은 산문집이니, 700여 쪽 분량이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러나 권혁웅(41) 시인은 산문의 전형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다. 그는 생활과 속내를 진솔하게 털어놓는 에세이 대신, 독자들이 지금껏 알아왔던 것들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해보기를 권한다. 그는 ‘몸과 사랑’이라는, 다소 진부해 보일 수 있는 테마를 택하지만, 이 테마를 지극히 개성적인 글쓰기 방식으로 풀어놓는다.
산문집의 각 장(章)에는 몸의 각 부분에 대한 소제목이 붙어 있다. 가령 ‘잡다, 만지다: 손·손 주름·손가락’, ‘보다: 눈, 눈썹’ ‘말하다, 맞추다: 입술, 혀, 입’ ‘떠맡다: 등, 어깨’ 같은 식으로. 시인은 사랑에 대해 이 ‘몸’들이 기능하는 모습을 시적인 산문으로 전하는데, 그의 작업은 육체를 재발견하게 한다.
‘그의 왼쪽 손목에는 하얀 밴드가 둘러쳐 있다. 시간이 그의 손목을 표백시킨 자리다. 그를 붙잡고, 그가 걸을 때마다 앞뒤로 그의 손을 잡고 걸었던 바로 그 자리다.’(‘손’에서)
‘아까시나무 아래를 걷던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어서 이 사람을 털어냈으면, 하는 것이다.’(‘머리’에서)
‘불어로 ‘아모르’라고 발음할 때 우리 입술이 젖꼭지를 향해 삐죽이 내민다면, 한국어로 ‘사랑’이라고 발음할 때 우리 입술은 젖무덤 전체를 받아들일 듯이 함박 벌어진다.’(‘젖가슴’에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 안쪽에 있는 것, 그것이 안심(安心)이다.’(‘심장’에서)
사색적인 문장들은 그간의 에세이 모습들과는 다르다. 읽다 보면 사랑의 감정을 책 읽는 눈만이 아닌, 책이 일러주는 몸 곳곳을 통해 느끼게 된다. 그러고 보니 사랑이란, ‘눈과 코와 입이, 손과 발과 몸이, 얼굴과 머리와 몸통이, 그리고 피부와 심장이 전부 다 당신을 향해 두근대는’ 것이 아니었던가.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스타일 >
-

광화문에서
구독
-

포토 에세이
구독
-

국방 이야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스타일]'비대칭형' 헤어컷…중성미가 찰랑 찰랑](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2/01/17/6845660.1.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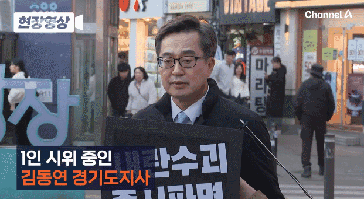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