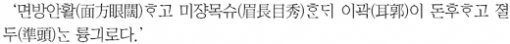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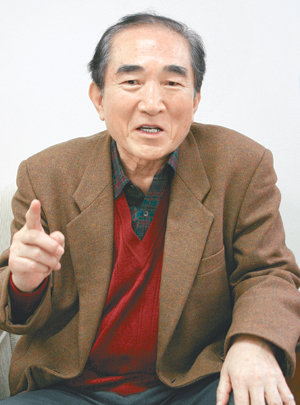

월간문예지 ‘문장(文章)’ 1941년 1월호에 소개된 또 다른 ‘고본춘향전’은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풀어썼다.
‘얼굴이 번듯하며 눈이 큼직하고 눈썹이 기름하고 눈이 말갓는데 귀바퀴 두둑하고 코마루 우뚝하다.’
이 ‘고본춘향전’은 그동안 학계에서 조명을 받지 못한 채 묻혀 있었다. 이를 박갑수(74·아래 사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최근 끄집어냈다. 박 교수는 “문학사와 문체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학계의 태만으로 60년 넘도록 방치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가 ‘문장’의 ‘고본춘향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난해한 작품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썼다는 점. 박 교수는 “작자는 알 수 없지만 한문투의 옛 문장을 한글이나 국한혼용으로 쉽게 바꿨다”면서 “춘향전의 독자층이 대중으로 확산된 계기가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자야.”
방 “예.”
이 “저 건너 운무 중에 울긋불긋하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사람인다 신선인다”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등장인물의 동작과 표정을 묘사하는 지문(地文)도 삽입됐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쉬운 말로 고쳐 쓴 데서 더 나아가 구어체로까지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 작품은 어려운 표현을 과감히 생략하거나 필요에 따라 문장을 추가했으며, 이전 판본에서 틀리게 썼던 내용들을 교정하는 등 고유의 특징이 뚜렷하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박 교수는 이런 작품이 그동안 묻혀 있었던 것에 대해 “최남선본 춘향전과 이름이 같고 줄거리가 비슷해 고전문학자들이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박 교수 논문 ‘문장지 소재 고본춘향전의 새로운 발견’은 ‘국어교육학회지’와 ‘한글+한자 문화’ 2월호에 동시 게재될 예정이다.
금동근 기자 gold@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