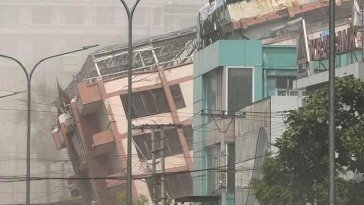멀티플렉스 시대… 잃어버린 문학의 은밀한 공간
‘극장’이라는 말이 문학 속으로 들어오면 ‘영화관’과는 다른 울림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극장은 영화를 상영하는 곳으로 묘사되지만 그런데도 ‘영화관’과는 다르다. 극장이라는 공간엔 유년의 추억이나 연애의 기억, 혼자 흘리는 눈물이나 사색 같은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1989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명보극장에서 같이 본 영화, 기억 안 나?”(김연수, ‘사랑이라니, 선영아’에서)
대학에 입학해 서울살이를 시작한 김연수(38) 씨가 서울의 큰 극장을 보고 떠올린 것은 고향 경북 김천의 ‘문화교실’이다. 고향의 역전극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학생들을 위한 영화를 상영했다. 그게 ‘문화교실’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반공영화부터 리샤오룽(李小龍) 영화까지 온갖 장르를 섭렵했다. 한 번 걸린 영화는 다른 마을을 돌다가 2년 뒤에 돌아왔다. 만화영화 ‘전자인간 337’이 걸렸을 때 아이들은 길게 줄섰다. 못 보면 2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극장엔 그런 설렘과 두근거림이 스며 있었다. 간절히 원하는 하나를 얻기 위한. 보고 싶은 영화든, 사랑이든.
“어느 가을날에 나는 충무로에 있는 한 극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그녀는 다짜고짜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컴컴한 극장 안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다.”(윤대녕, ‘은어낚시통신’에서)
이 극장은 물론 대한극장이다. 윤대녕(46) 씨는 20대 후반 서울 충무로의 한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주 대한극장에 들렀다. 때마침 영화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그는 낡은 극장에서 새로움이 나오는 것을 봤다. 스크린에서 이야기가 새어나오는 어둡고 밀폐된 공간은, 작가에게는 영감의 장소가 됐다. 그곳은 윤 씨를 앞선 시대와는 구별되는 ‘90년대 작가’로 만들어 준 유명한 ‘은어낚시통신’의 배경이 됐다.
“대한극장이 개보수하기 전, 집사람과 ‘아라비아의 로렌스’를 봤어요. 그곳의 모습이 바뀐다니,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지만 뭔가 거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많은 문학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진다. 예술영화 전용극장에서만 상영되는 제3세계 영화까지 꿰고 있다는 소설가 박완서 씨를 비롯해, 많은 영화잡지에 작가들의 리뷰가 실릴 정도로 문학과 영화는 가깝다. 그런데 극장은?
“태오의 손을 꽉 잡은 채 극장으로 갔다. 용산CGV 로비의 여자화장실은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터지기 직전이었다.”(정이현, ‘달콤한 나의 도시’에서)
2005년 쓰인 이 소설에서 ‘어째서 극장?’이냐고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소설에서 태오와 은수는(그리고 아마 실제로도 2000년대의 젊은이들은) 스타벅스 가듯, 베트남쌀국수 먹으러 가듯 멀티플렉스 극장을 가기 때문이다.
멀티플렉스에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한 줄이 없다. DVD방에, 개인컴퓨터에, 영화는 곳곳에서 흘러넘쳐 새롭지도, 은밀하지도 않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의 문학에서 극장은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구별되는 의미를 덧입히기 어려워서다. 작가들은 아마 다른 문학적 공간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걸 찾게 되면 우리는 문학 속에서 다른 ‘극장’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사이버 영파워]디지털랭크 곽동수 사장](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