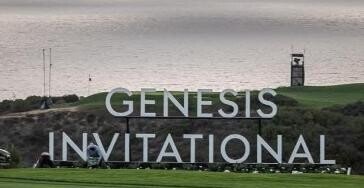"사랑에 눈뜨면서 '나'의 개성과 욕망을 확인하고, 사랑을 위해 싸우면서 세계와 정면충돌하고, 연애편지를 쓰고 또 고쳐 쓰면서 문학을 연습했던 것이 한국 근대문학의 첫 장면이다." 평론가 권보드래 씨는 1920년대 김동인과 염상섭 소설의 연애에 대한 냉소가 60년대 최인훈과 김승옥에 맞닿는다고 짚는다. 은희경 배수아 정이현 소설 속 연애에 대한 지독한 회의는 역설적으로 여전히 연애가 현재진행형인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평론가 이광호 씨에 따르면 "한국 현대문학은 '도시' 속에서, 도시의 인간에 의해, 그 현대적 미학을 만들어간 것"이다. 1930년대 경성을 관찰한 박태원의 '천변풍경'부터 1980년대 후반 압구정동을 훑는 시인 유하의 시선, 2000년대 도시의 점령군 편의점을 들여다본 김애란의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 이르기까지 "표준화 평균화의 방식으로 개인성을 소모시키면서, 개인적인 것의 가치를 과장하도록 촉구하는" 도시가 펼쳐진다.
여름호에 소개될 '육체'는 유교적 이념에 붙들렸던 근대 이전의 세계를 벗어나 문학이 몸을 발견하고 사유해온 과정을 보여준다. '양공주'라는 '특화된 소비상품'으로 몸이 활용된 전후 소설, 몸을 이념에 귀속시켰던 1980년대 운동권 소설을 지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 은희경 전경린 등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몸의 사유에 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난다. '이념에 구멍을 내는' 몸을 인식하게 된 것.
"20세기 한국문학은 '나'는 누구인가, 혹은 나와 너는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한 탐구였다."(평론가 우찬제 씨) 일제시대 카프문학과 1970, 1980년대 민중문학에서는 사회적인 '나'의 임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았으며, 최인훈 이청준의 관념소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존재론적으로 '나'에 대해 질문했다. 한편으로 김춘수의 시 '꽃'에서처럼 '나'와 '너'와의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평론가 김형중 씨는 최인훈의 '구운몽', 한승원의 '꿈' 김성동의 '꿈' 등 꿈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통해 실현되지 않는 욕망을 투영하는 꿈의 서사를 훑는다.
평론가 이수형 씨는 월북한 아버지로 인해 정체성의 갈등이 폭발하는 최인훈의 '광장'부터 '아버지의 신화'를 아예 없앤 김영하의 '퀴즈쇼'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학은 '가족' 로망스의 자장 안에 있다"고 밝힌다. 평론가 박혜경 씨는 젠더(성)의 문제가 문학에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강인하고 자애로운 모성(황순원)과 순결한 누이(김승옥), 육욕의 대상(장정일), 영적 교감의 대상(윤대녕) 등 남성 작가의 작품 속 많은 여성상을 분석한다. 평론가 류보선 씨에 따르면 일제시대 문학에서는 민족이라는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무엇보다 강렬하게 요구됐지만, 최근작인 김영하 '검은 꽃'은 탈민족화의 주제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이라는 테마는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하나하나 한국문학을 뜨겁게 달구었던 테마들이다. '문학과사회'는 "이 테마들은 한국문학이 근대성을 구축하고 그 균열과 모순을 발견하는 데 큰 의미를 가졌던 주제어들이며 앞으로의 새로운 문학담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