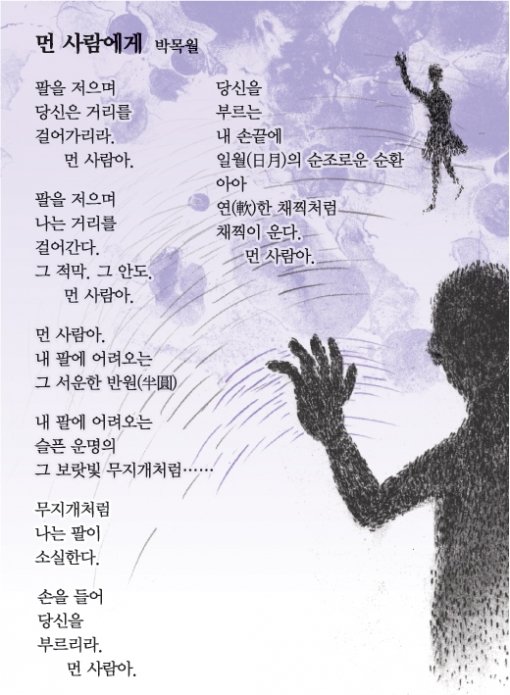
‘내 팔에 어려오는/그 서운한 반원’에는 반원의 결여가 보랏빛 무지개처럼, 어느새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걸쳐져 있다. 먼 사람아, 그렇게 나는 서운한 결여를 호명으로써 메우는 게 아니라 결여를 존재처럼 확인한다. 당신은 없다. 나의 팔은 당신에게 닿을 수 없다. ‘무지개처럼/나는 팔이/소실한다.’
팔의 반원을 넘어 당신을 부르는 내 손끝에는 ‘연한 채찍’ 같은, ‘울음’ 같은 떨림이 진동하고 있다. 당신의 부재가 진동하고 있다. 해와 달의 순조로운 순환, 자연의 영원하고 완전한 원을 배경으로. 이 배경은 유한한 사랑, 결여의 통각으로 존재감을 얻는 사랑, 인간의 불완전한 사랑에 대비되는 신적인 무한함이자 완전함이다.
그러나 이 무한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의 대조가 유한자의 슬픔을 치명적으로 키우거나 허무에 빠뜨리진 않는다. 목월 뒤에 남은 마지막 시집에 따라 말한다면 ‘크고 부드러운 손’ 속에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목월의 연한 울음은 일상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각되지 않는 일상을 떨리게 한다. 그리하여 일상은 문득 반짝이고 오늘도 나는 팔을 저으며 거리를 걸어간다.
김행숙 시인·강남대 교수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환자곁에서]"보채는 게 반가워요"](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동아광장/송인호]빚더미 부동산 PF, 글로벌 기준 맞게 구조 개선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86489.1.thumb.png)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0402416.1.thum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