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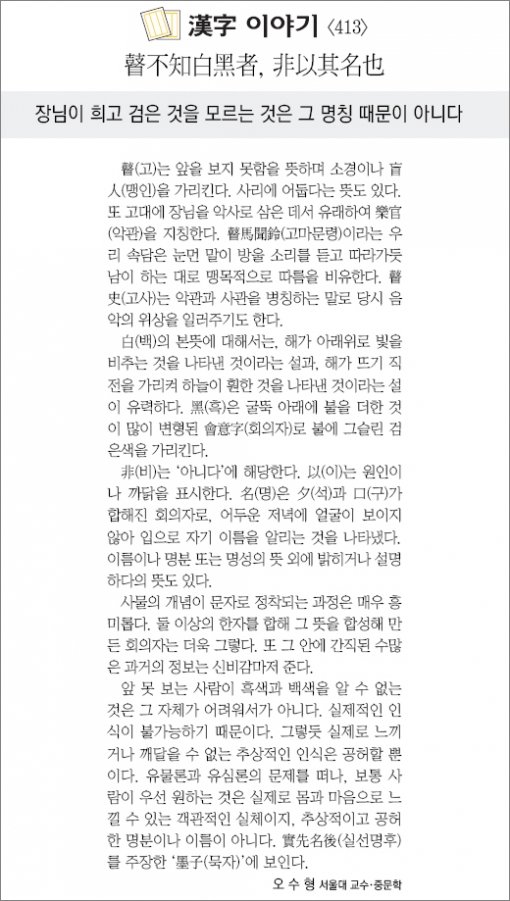
白(백)의 본뜻에 대해서는, 해가 아래위로 빛을 비추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과, 해가 뜨기 직전을 가리켜 하늘이 훤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黑(흑)은 굴뚝 아래에 불을 더한 것이 많이 변형된 會意字(회의자)로 불에 그슬린 검은색을 가리킨다.
非(비)는 ‘아니다’에 해당한다. 以(이)는 원인이나 까닭을 표시한다. 名(명)은 夕(석)과 口(구)가 합해진 회의자로, 어두운 저녁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 입으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을 나타냈다. 이름이나 명분 또는 명성의 뜻 외에 밝히거나 설명하다의 뜻도 있다.
사물의 개념이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둘 이상의 한자를 합해 그 뜻을 합성해 만든 회의자는 더욱 그렇다. 또 그 안에 간직된 수많은 과거의 정보는 신비감마저 준다.
앞 못 보는 사람이 흑색과 백색을 알 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실제적인 인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듯 실제로 느끼거나 깨달을 수 없는 추상적인 인식은 공허할 뿐이다. 유물론과 유심론의 문제를 떠나, 보통 사람이 우선 원하는 것은 실제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객관적인 실체이지, 추상적이고 공허한 명분이나 이름이 아니다. 實先名後(실선명후)를 주장한 ‘墨子(묵자)’에 보인다.
오수형 서울대 교수·중문학
성매매 특별법 시행 논란 : 성매매 신종 업태 >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

딥다이브
구독
-

오늘과 내일
구독
-

오! 여기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