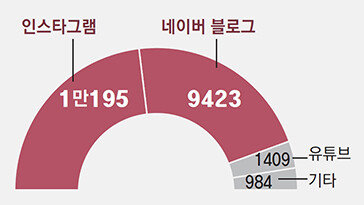3일 오후 한국문학번역원 주최로 열린 프랑스 대표적인 문예지 NRF(La Nouvelle Revue Fran¤aise)의 미셸 브도로 편집장과 한국 계간지 편집장들과의 대담은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브도로 편집장은 우선 단편 중심의 한국문학 구조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의 경우 일간지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이 일정 기간 활동 후 소설집을 묶어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학동네 염현숙 편집국장은 “단편으로 등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인 작가가 역량을 키운 후 장편에 도전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브도로 편집장은 “프랑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선 단편을 상품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인에겐 단편을 쓰는 걸 피하라고 한다”라면서 “작품성 있는 장편으로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독자 역시 이야기의 힘이 떨어지는 단편보다 장편을 선호해 시장에서도 단편집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
브도로 편집장은 “장편을 소개할 땐 소설 일부를 발췌해 문예지에 싣고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한다”고 말했지만 우리에겐 낯선 방식이다. 한국 편집장들이 “독자들이 그런 방식을 용납하느냐” “문예지가 완결성을 갖춘 책이 아니라 안내서 역할만 하는 건 아니냐”고 질문하자 브도로 편집장은 오히려 “문예지가 안내서 역할을 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단편 소화에 주력하는 한국 문예지들과의 인식차가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이번 대담은 장편 위주인 세계 문학의 흐름과 한국문학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의 등단 시스템이나 문학상은 단편 위주고 문예지들 역시 단편을 선호한다. 그러다 보니 작가 지망생들의 습작도 단편 위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단편문학 양산이 서사성 약화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문단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계간 ‘창작과 비평’ 염종선 편집장은 “단편집 형식 때문에 국내 문학이 해외 진출에 제약을 받는 것은 사실이고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민음사 장은수 대표는 “경장편을 싣는 계간지 창간을 계획 중”이라고 했다.
‘이야기 산업’이라는 말도 나올 만큼 서사는 문화콘텐츠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장편 위주의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단편집도 잘 팔린다’거나 ‘장편을 발췌해 문예지에 소개하면 독자들이 책을 사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체질 개선이 필요한 때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 >
-

초대석
구독
-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구독
-

유레카 모멘트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고구려 코드…2000년의 비밀]무령왕의 왕관에 깃든 靈氣무늬의 비밀](https://dimg.donga.com/a/180/101/95/2/wps/NEWS/IMAGE/2005/08/29/6952867.1.jpg)
![기업 사활 걸린 상법 개정인데… ‘표’만 보고 계산기 두드리는 野[광화문에서/김지현]](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8500.1.thum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