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린 대가 댁의 고명딸, 역병으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사는 화전마을 아이, 억척스레 시장을 돌며 어머니의 병 수발을 드는 방물장수, 귀양 온 천주학도에게 글을 배우고 세상을 배워 나가는 숯장수….
녹록지 않은 세파들이다. 배경이 조선시대 어디쯤으로 설정된 것 외엔 이들이 마주한 삶의 모습은 사뭇 현실적이다. 뜻하지 않게 닥쳐 온 불행이나 누명, 가난, 신분의 한계로 인한 부조리들이 그렇다.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는다. 동화집 ‘꽃신’은 자기 영역을 지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산뜻한 템포로 섬세하게 그려냈다.
‘다홍치마’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라는 역사의 행간에서 상상력을 발휘했다. 숯장수인 큰돌이는 귀양 온 양반에게 글을 배우게 된다. 양반이라면 ‘옆구리에 책만 끼고 있지 하는 짓이 칼춤 추는 망나니’라고 생각했지만 선생님은 다르다. 큰돌이가 천민이라 구박하는 학동들에게 “신분이 낮다 하여 업신여기는 아이는 곧 나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고 꾸짖고, “너처럼 심성 깊고 총명한 아이를 천민이라고 홀대하는 세상이 얼마나 더 오래가겠느냐”고 말하기도 한다. 시대로부터 배척당한 스승에게서 배어난 학식과 비애가 큰돌이를 자라게 한다.
표제작 ‘꽃신’은 역모의 죄를 쓴 대가 집 딸 선예가 절에 머물면서 화전민의 딸인 달이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 두 소녀가 감당해야 하는 아픔이 가볍진 않지만 이야기는 그들의 비극 자체가 아니라 때 묻지 않은 소녀들의 여린 마음과 감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골 고아인 달이가 민들레와 짚신을 엮은 꽃신을 대가 댁 딸 선예에게 선물해 주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억척스러운 삶에 순수한 동심이 잘 버무려진 동화도 있다. ‘방물장수’에선 병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악스럽게 시장을 누비는 덕님이의 일상이 생생하다. 방물장수 홍석이를 향한 덕님이의 설렘이나 덕님이를 딸처럼 아끼고 예뻐해 주는, 사람 좋은 김 행수 등은 읽는 이의 기분을 즐겁게 한다.
동화의 끝은 완결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이다. 선예는 비단 꽃신 대신 민들레로 엮은 짚신을 신고 산길로 도망쳐야 하고, 덕님이는 봇짐을 메고 방물장수가 되어 길을 나선다. 큰돌이 역시 스승의 다홍치마를 딸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배를 탄다.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풍부한 여운과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을 빼닮았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동화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 준 김동성 화가의 그림은 이야기의 서정성에 힘을 싣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드라마 e장소 : 술집 >
-

정세연의 음식처방
구독
-

광화문에서
구독
-

횡설수설
구독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드라마 e장소/술집]'부담없는 가격, 그러나 안주는 푸짐'](https://image.donga.com/donga_v1/images/img_default.p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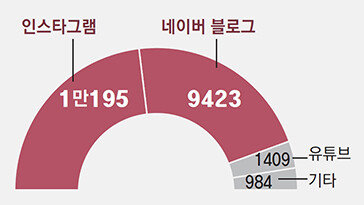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은 이달 28일, 선배 의사들도 이젠 복귀 독려해야”[월요 초대석]](https://dimg.donga.com/a/464/260/95/1/wps/NEWS/FEED/Donga_Home_News/131218501.1.thumb.jpg)